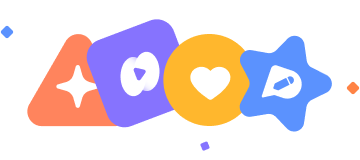기억이란, 우리 존재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 처음 몇 년간의 기억을 전혀 떠올릴 수 없다.
첫돌, 젖병, 걸음마… 수많은 사진과 영상이 존재해도 정작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은 없다. 왜 우리는 생애 초기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오랜 시간 동안 학계는 이 질문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답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기존 가설을 뒤흔드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며 논의의 방향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유아기 기억상실: 해마의 미성숙이 원인이라는 기존 통설
대부분의 뇌 과학자들은 유아기의 기억 부재 현상을 '유아기 기억상실(Infantile Amnesia)'이라 부른다.
이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뇌의 해마(hippocampus)가 생후 수년간 완전히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마는 장기 기억, 특히 시간과 장소가 있는 사건 기억(에피소드 기억)을 저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위다. 따라서 이 시기의 뇌는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그간의 주류 견해였다.
새로운 연구, 기존 통설에 반기를 들다
2025년 3월 20일, 메디컬 프레스(Medical Press)는 예일대학교 닉 터크-브라운(Nick Turk-Browne) 교수 연구팀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해당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됐으며, 유아기의 기억 형성에 대한 기존 이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연구팀은 생후 4개월에서 2세 사이의 영아 26명을 대상으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을 활용해 뇌 활동을 분석했다.
실험에서는 아기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준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해당 이미지와 처음 보는 이미지를 나란히 제시했다. 아기들이 두 이미지 중 어느 쪽을 더 오래 응시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기억 반응을 평가했다.
그 결과, 이미지가 처음 제시될 당시 해마의 후방 부위에서 강한 신경 활동이 관찰된 아기들이 이후 같은 이미지를 다시 보았을 때 더 오래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부위는 성인의 에피소드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아기들도 특정한 사건이나 장면을 기억할 수 있으며, 그 기억은 실제로 해마에 저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기억은 형성되지만, 회상의 경로가 차단되는 가능성
이 연구는 유아기의 기억이 아예 생성되지 않는다는 기존 통념을 뒤집는다. 기억 자체는 존재하지만, 이후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회상 불가능' 상태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연구 책임자인 터크-브라운 교수는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접근할 수 없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억이 단지 뇌의 물리적 저장 여부뿐 아니라, 그것을 ‘꺼내는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시간이 지나며 특정 신경 회로가 약화되거나 재조직되면서, 초기 기억에 도달하는 경로가 끊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해마 내부 구조에 따른 기억 발달의 차이
이번 연구는 해마가 단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님을 강조한다. 해마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전방 부위(anterior hippocampus): 반복적인 패턴 인식에 기반한 ‘통계적 학습’을 담당
✅후방 부위(posterior hippocampus): 특정 사건을 기억하는 ‘에피소드 기억’을 담당
통계적 학습은 생후 수개월부터 빠르게 활성화되며, 언어 습득과 개념 형성 등 인지 발달의 기초가 된다. 반면, 에피소드 기억은 생후 1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간의 뇌가 생애 초기에는 ‘세상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이후에야 개별 사건을 기록하는 방향으로 발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억은 어디로 가는가: 장기 연구의 시작
예일대 연구팀은 현재 기억의 지속성과 회상 가능성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 중 하나는 아이가 유아기 때 촬영된 홈비디오를 유치원 시기 이후에 다시 보여주었을 때의 반응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초기 결과에 따르면 일부 아이들은 해당 장면에 대해 놀람, 기시감, 정서적 반응 등을 보였으며, 이는 기억이 단기적으로는 유지되며 일정 수준까지 접근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유사한 연구들이 기억의 '지속 시간'과 관련한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아기 기억이 성인기의 무의식적 반응이나 행동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로 확장될 가능성도 크다.

'잊었다고 해서 없던 것은 아니다’
이번 연구는 유아기 기억상실에 대한 해석을 단순한 생리적 미성숙에서 기억 접근의 문제로 확장시킨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기억은 기록되는 것만큼, 꺼낼 수 있어야 ‘기억’이 된다. 우리가 아기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모든 순간이 무(無)로 존재했던 것은 아닐 수 있다.
과학은 이제, 인간이 잃어버린 첫 기억의 조각들을 추적하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을 다시 마주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 기억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삶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될 것이다.

Copyrigh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