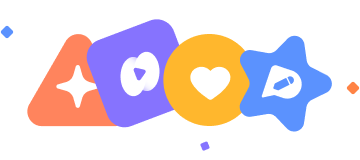상상해 보자. 쉐보레 중형 세단 말리부가 뒷바퀴굴림이라면 어떨까?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내세워 현대 쏘나타의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지는 않았을까? 누군가는 ‘생산 가격이 올라서 수지 타산이 안 맞아’라고 빈정거릴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미 그런 차가 있었다. 동시대 앞바퀴굴림 세단과 진검승부를 펼쳤던 뒷바퀴굴림 중형 세단, 대우 프린스다.

프린스는 진짜배기 ‘성골’로 등장했다. 1980년대 우리나라 고급차 시장을 휩쓸던 대우 ‘로얄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후속이었으니까. 로얄시리즈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국내 모든 중형 세단 판매량이 1만474대였던 1985년 홀로 8715대를 판매하며 시장의 83%를 독식했다. 1980년대 로얄시리즈는 명실상부 성공의 상징이었으며 고급차의 대명사였다.

그러나 영원한 인기는 없었다. 1986년 현대자동차가 일본 미쓰비시와 손잡고 야심 차게 준비한 그랜저가 등장하며 로얄시리즈가 휘청이기 시작했다. 시장 점유율이 순식간에 64%로 떨어졌다. 미래를 낙관하던 대우차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987년 대우차는 곧장 로얄시리즈 개혁의 꿈을 담은 V-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해외 모델을 거의 그대로 조립해 팔던 기존 방식과는 결이 다른 본격적인 고유 모델 개발 프로젝트다. 로얄의 중심이던 중형 세단, 로얄프린스를 밑바탕 삼아 대우차 개발진의 손길을 더했다.

1983년 대우차가 GM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한 후 쌓아왔던 개발 역량이 빛을 발했다. 신진자동차(대우자동차 전신) 시절과 비교해 12배가량 규모를 키운 부평연구소 디자인팀이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또 1년 먼저 시작한 에스페로 개발 프로젝트로 쌓은 경험을 적극 활용해 프린스도 공기역학을 고려한 스타일로 빚었다. 엔진과 냉각 시스템 개발은 호주 홀덴과 협업했고, 브레이크 시스템은 독일 보쉬와 기술 협력을 맺어 완성했다.

1991년 마침내 44개월간 504억원을 투자한 V-카 프로젝트가 프린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공기저항계수(Cd) 0.31인 매끈한 스타일은 에스페로 못지않게 미려했다. 무엇보다 뒷바퀴굴림이던 로얄프린스를 밑바탕 삼은 비율은 균형 잡혔을 뿐 아니라, 차체 전체 길이 4802mm로 당시 중형 세단 (현대 쏘나타가 4680mm였다)을 덩치로 압도했다. 홀덴 기술로 완성한 전자제어 MPFI 2.0L 엔진 역시 최고출력 115마력으로 부족함 없는 성능을 자랑한다.
1990년 로얄시리즈 중형 세단 시장 점유율은 19%까지 추락한 상황. 프린스는 몰락하던 로얄 왕가의 마지막 반격이었다. 신차 효과에 힘입어 현대 쏘나타의 맞수로 떠올랐으며, 국내 유일 뒷바퀴굴림 중형 세단으로서 꾸준한 인기를 끌었다. 뉴프린스로 부분변경하기 직전인 1995년 판매량을 살펴보면 한 해 동안 9만2359대를 판매해 국내 승용차를 통틀어 판매 5위, 중형 세단 시장 2위 자리를 꿰찬다. 당시 쏘나타는 쏘나타2로 진화하고, 기아자동차는 콩코드 뒤를 이은 신차 크레도스를 내놨는데도 프린스 인기는 흔들리지 않았다.

프린스는 1997년 후속 모델인 레간자 등장 후 렌터카와 택시 모델로 병행 생산을 이어가다 1999년 9년간의 긴 역사를 마무리 지었다. 누적 생산량 60만88대를 기록했고, 이중 국내 판매대수는 59만1784대다. 중형차 왕국으로 군림했던 대우 로얄시리즈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로얄시리즈 최종장이 막을 내린 지 22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 로얄의 마지막 핏줄 프린스를 실물로 마주했다. 첫인상이 참 매끈하다. 곳곳이 각 잡힌 에스페로를 사포로 다듬은 듯 부드럽게 둥글린 보닛과 옆면이 말끔하게 어우러졌다. 무엇보다 앞바퀴를 앞으로 바짝 붙인 뒷바퀴굴림 비율과 뒤를 높이 들어 올린 ‘하이데크’ 윤곽이 어우러져 큼직한 차체가 무색하게 역동적이다. 비록 앞에서 보면 차체 너비보다 바퀴 트레드(타이어 중심 사이 좌우 거리)가 너무 좁아 다소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당시에도 쏘나타2 앞 트레드가 1515mm였는데 프린스는 1435mm에 불과했다).


그때는 두꺼운 편이었던 두께 222mm 문짝을 열어 운전석에 앉았다. 옛날 차답게 개방감이 아주 좋다. 길쭉한 보닛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옆 유리창이 아래로 깊게 패어 양옆이 훤히 눈에 들어온다. 그 시절 동급 세단 중 가장 높은 시계율을 자랑하던 프린스다. 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계기판처럼 좌우로 길고 네모난 계기판도 중후한 분위기를 풍긴다.


뒷좌석은 더욱더 그렇다. 다리 공간이 널찍하고 등받이가 충분히 누워 ‘회장님’처럼 거만하게 앉을 수 있다. 널찍한 옆 유리창과 거대한 쿼터글라스 덕분에 시야도 막힘없다. 프린스의 E세그먼트급 뿌리를 뒷좌석에서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참고로 프린스 밑바탕 로얄프린스는 독일 E세그먼트 시장을 겨냥한 오펠 레코드 E2를 들여온 차였다.
열쇠를 비틀어 시동을 걸자, 거친 시동 모터 소리와 함께 엔진이 깨어났다. 시승차는 1995년식 1.8L 엔진과 5단 수동변속기를 맞물린 모델. 이 차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이유다. 오늘날 우리 땅에서 완전히 멸종한 뒷바퀴굴림 수동변속기 세단이다. 수입차로도 만날 수 없는 진귀한 구성이 아닌가.
설레는 마음으로 시프트레버를 잡았다. 군토나(실제 이름은 K131) 타던 운전병 시절이 절로 떠오른다. 그때 그 차처럼 레버 조작감이 아주 헐렁하다. 시프트레버만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이랄까. 자, 화물차처럼 크게 움직이는 시프트레버를 1단에 집어넣고 출발!

아주 묵직하다. 대형 세단처럼 무게로 부드러운 스프링을 꾹꾹 누르며 천천히 흔들린다. 출력도 마찬가지다. 진중하게 rpm을 끌어올리며 앞으로 나아간다. 길이 4802mm에 달하는 큼직한 뒷바퀴굴림 세단인 만큼 무게가 무거운 까닭일까 하긴 그 시절 우리나라엔 경량화 개념조차 생소했을 테다.
나중에 알아본 공차중량은 단 1220kg에 불과했다. 대단하다. 웬만한 준중형 승용차보다 가볍다. 그럼에도 서스펜션을 어찌나 부드럽게 조율했는지, 운전 감각이 2t급 F세그먼트 대형 세단을 타는 듯 묵직했다. 차분한 가속감은 그저 최고출력 110마력 힘이 넘쳐나지 않았던 까닭이다.

그만큼 편했다. 스프링이 연하디 연해 뒤쪽 움직임이 신경질적일 수밖에 없는 뒤 리지드액슬 구조(뒷바퀴 양쪽이 한 막대로 이어진 방식) 특성까지 지웠다. 엔진도 마찬가지다. 평범한 직렬 4기통 엔진이 rpm을 끌어 올려도 조용하고 진동이 적다. 3000rpm까지 엔진회전수가 치솟아도 계기판을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 더 고회전으로 돌려보진 않았지만, 중저속 rpm 구간 회전 질감만큼은 가히 6기통 엔진이 부럽지 않다.

이토록 정숙하고 편안한 이유는 당시 대우그룹 전체에 불었던 ‘저소음’ 바람의 영향이었다. 프린스 역시 1993년 영국 로터스의 손길로 승차감을 개선했으며, 엔진룸, 실내 벽, 차체 바닥 곳곳에 흡음재를 덕지덕지 붙여 저소음 실현에 집중했다. 엔진 소리는 배기관 길이를 59cm나 늘여 꽉 틀어막았다. 1994년 대우차 자체 테스트 결과 시속 100km로 달릴 때 실내 소음이 이전 72dB에서 63dB로 훌쩍 줄었다. 시승차는 이 모든 개선점을 고스란히 품은 1995년식이다.
프린스는 부드러웠다. 리지드액슬 하체의 구조적 단점이 묻힐 정도였고, 동시에 뒷바퀴굴림 수동 세단의 경쾌함마저 묻혔다. 서스펜션이 낭창해 코너를 돌아나갈 때 충분히 휘청이고 기어를 바꿔 물리는 맛은 헐렁한 시프트레버와 배기 소리를 꽉 틀어막은 엔진 탓에 무미건조하다. 우리나라 고급차 시장을 이끌던 정통 로얄의 후예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프린스가 현역일 때도 부드러운 움직임과 과거의 명성에 힘입어 젊은 고객보다는 주로 중장년층으로부터 사랑받았다.

구석구석 살펴보며 인상 깊었던 점은 차체 부식이다. 문짝 이음새나 볼트에 생긴 가벼운 부식을 빼면 출고 후 26년 세월이 무색하게 굵직한 차체 부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독일 오펠 레코드 E2 기본 설계를 그대로 쓴 만큼 배수 설계가 뛰어났던 모양이다. 재밌게도 훗날 등장하는 대우 독자 개발 모델들은 치명적인 부식이 심심찮게 발생했다.
차주 설명에 따르면 실제 주행 연비는 고속도로 위에서 1L에 12~13km, 도심에선 1L에 7~8km다. 제원상 공인연비는 1L에 13.15km. 비교적 배기량이 작은 1.8L 엔진과 1220kg 가벼운 덩치, 동력 손실 적은 수동변속기가 어우러져 연료효율이 요즘 차 못지않다.

대우 프린스. 개인적으로 탐났다. 잠깐의 운전 경험이 머릿속에 수동변속기로 뒷바퀴 동력을 주무르며 쭉 뻗은 도로를 유유자적 누비는 그림을 그렸다. 중후하다. 편하다. 효율까지 좋다. 앞뒤 48:52인 우월한 무게배분은 또 어떻고. 참 기계적으로 흥미로운 자동차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우 로얄의 마지막은 지금까지도 빛바래지 않았다.
글 윤지수 사진 이영석
대우 프린스에 얽힌 시시콜콜 이야기

로얄시리즈를 관통하다
프린스의 뿌리는 상상을 초월하게 깊다. 프린스만 보아도 9년을 장수했고, 1983년 등장한 로얄프린스까지 합치면 역사가 16년에 달한다. 그런데 로얄프린스의 원작 오펠 레코드 E2가 레코드 E1의 부분변경 모델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레코드 E1을 토대로 만든 차가 1978년 등장한 최초의 로얄이다. 대우 로얄시리즈 시작과 끝이 하나로 이어진 셈이다.

중고차 시장에서 인정받다
오랜 역사 동안 개선에 개선을 거쳐온 프린스는 견고한 품질로 인정받았다. 일례로 1995년 서울시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이 중고차 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7.2%가 프린스를 ‘좋은 중고차’로 골랐다. 현대 쏘나타와 기아 프라이드를 누르고 1위를 거머쥐었다.

뒷좌석이 번쩍이다
전 국민이 프린스를 집중하는 사건이 있었다. 우리나라 유일무이 대머리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검찰 소환장을 거부하고 고향 합천으로 내려갔을 때, 그를 감옥까지 압송한 차가 프린스였다. 약 300km를 달리는 동안 기자들 플래시를 터뜨렸고, 그때마다 뒷좌석 가운데가 번쩍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