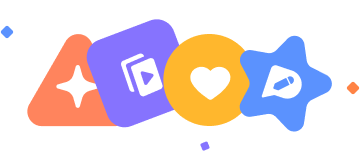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도 이해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되면서 협업, 문제 해결, 자연어 인식 능력이 더욱 향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을 확인하세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공지능을 만났을때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두 대가 주방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장을 본 물건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정리해 줘”라고 말하자 분주히 움직입니다. 냉장고 앞에 있던 로봇은 문을 열어 달걀과 치즈, 케첩을 차례로 넣고 서랍 앞에 있던 로봇은 쿠키를 정리합니다. 한 로봇이 사과를 들자 다른 로봇이 마치 바구니에 넣으라는 듯 바구니를 밀어넣는 ‘협업’까지 보여줍니다. 미국의 로봇 스타트업 ‘피겨 AI(Figure AI)’가 최근 공개한 가사 로봇의 모습입니다.
노르웨이 로봇 스타트업 ‘1X’의 휴머노이드 로봇도 다양한 일을 척척 해냅니다. 커피를 따르고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 벽에 걸린 액자의 균형을 맞춥니다. 청소기를 작동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움직임은 다소 느리지만 이들은 명령을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걷고 뛰는 건 기본, 사람 말 이해하고 그에 맞춰 행동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걷고 뛰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제는 달걀이나 포도주잔처럼 깨지기 쉬운 물건도 안전하게 들고 옮길 수 있으며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휴보’나 ‘아시모’처럼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걷고 뛰며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지만 일상에서 실용적으로 쓰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작업 계획(Task Planning)’ 때문입니다. 로봇에게 작업 계획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작업과 그 순서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물건을 집어 냉장고에 넣으려면 먼저 물건을 인식해 깨질 위험이 있는지 파악한 후 적당한 힘으로 잡습니다. 이후 떨어지지 않게 든 뒤 냉장고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문을 엽니다. 그다음 빈 곳을 찾아 적절한 위치에 물건을 넣습니다. 이 과정이 계산돼 있지 않으면 로봇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변수가 발생할 경우 로봇은 해결책을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는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AI 기술이 로봇 상용화 한계 극복에 결정적 역할
AI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은 주변 환경을 빠르게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AI는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을 조금 더 세게 당겨본다’거나 ‘손잡이 위치를 다시 확인해 본다’라는 식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기존 로봇은 냉장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다음 행동을 계산하는 데 오랜 시간을 썼지만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생성형 AI는 사람의 언어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과거 AI 스피커는 특정 명령어만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표현이 다르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문법이 틀리거나 모호한 표현도 맥락을 파악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로봇에 적용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과 더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도 AI 기반 로봇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초 발표한 ‘코스모스’ 플랫폼은 물리적인 AI 시스템 개발을 돕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이 플랫폼은 텍스트, 이미지,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공간에서 물리적 세계를 재현합니다. 물리적 세계를 가상공간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계산 능력이 필요했는데 엔비디아의 AI 칩이 이를 가능케 했습니다. 현재 많은 로봇은 이를 이용해 가상공간 속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데 도움을 줍니다.
AI가 ‘뇌’ 역할을 담당하면서 로봇은 단순한 기계를 넘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는 더 이상 공상과학(SF)이 아닙니다.
원호섭
과학이 좋아 마블 영화를 챙겨보는
공대 졸업한 기자.
‘과학 그거 어디에 써먹나요’,
‘10대가 알아야 할 미래기술10’ 등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