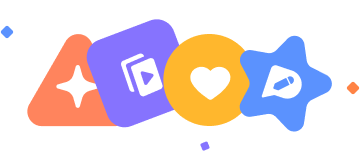미국에 자동차가 많다는 것, 다 아시는 얘기죠. 자동차의 나라답게 로스앤젤레스(LA)는 온갖 브랜드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모델이 도심, 프리웨이, 하이웨이 심지어 주택가를 가릴 것 없이 가득했습니다. 인구 3억3000만명의 미국은 2억 7000만대 가량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4억 인구의 중국이 1억 대를 조금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인지 러시아워, 출근이나 퇴근 시간 차량 정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주간 머문 일정의 마지막 날, LA 한인타운에서 공항까지 가는 30km 남짓한 거리에서 실감을 했는데요. 1시간 정도 여유를 갖고 체크인 시간에 맞춰 한인타운에서 출발했는데 공항이 뻔히 보이는 약 5km 남짓한 거리를 남기고 앞두고 말로만 듣던 지옥같은 정체를 만났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결국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짧은 거리에서 1시간 이상을 보내야 했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명절 대이동, 5000만명 이상이 이동(대부분 항공편)하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하필 이날 시작됐다고 합니다. 결국 일행 모두 다음 일정을 부랴부랴 알아봐야 했습니다. 2019 LA 모터쇼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일정이 의도치 않게 하루 연장된 셈이죠. 어쨌든 미국, 그중에서 여기 인구의 10% 이상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 일대의 자동차 트랜드, 교통, 문화 등을 체험하기 위해 머물면서 느낀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맹탕, 모터쇼의 한계를 드러낸 LA 오토쇼

LA 오토쇼도 완성차의 모터쇼에 대한 인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올해 열린 굵직한 모터쇼가 모두 그랬던 것처럼 LA오토쇼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역대급으로 홍보한 월드 프리미어도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신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도 현대차 차세대 SUV의 기반이 될 '비전 T',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고성능 전기차나 파생모델이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공개가 더 이슈가 됐죠.
쉐보레와 포드는 미국 시장을 노린 픽업트럭에 열중했고 독일과 일본 브랜드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동화 모델에 집중했습니다. 그들만을 위한 것이니까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머스탱을 기반으로 한 포드의 SUV 전기차 '마하 E', 포르쉐 타이칸 4S, 아우디 e-트론 스포츠백, 토요타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공개가 됐지만 일반인 관람이 시작되면서 뒷전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GV80, 신형 K5, 쏘나타 N, 미국 시장을 겨냥한 픽업트럭 등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높였던 현대차와 기아차, 제네시스 브랜드도 콘셉트카 비전 T, 셀토스, G90으로 모터쇼의 구색을 갖추는데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다녀 본 국내ㆍ외 모터쇼에서 현대차나 기아차 부스가 이번처럼 빈약해 보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쉐보레, 포드, 지프, GMC, 램 그리고 알 수 없는 브랜드까지 엄청난 덩치의 픽업트럭을 전면에 내세우는 바람에 모터쇼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 대부분은 마치 트럭 전시회 같기도 했습니다. 아직 픽업트럭 양산 모델을 갖고 있지 않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부스가 그래서 더욱더 초라해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 LA 모터쇼는 미국 시장의 픽업트럭을 위한 전시회였습니다.
마음껏, 부러워도 너무나 부러웠던 자동차 문화

매월 마지막 주, 미국 전역에서는 이색적인 자동차 모임 '카즈 & 커피(Cars & Coffee)가 열립니다. 1980년대 LA 헌팅턴비치의 작은 도넛 가게에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고교 동창들의 모임으로 시작해 지금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앰버말, 브라이슨 시티, 댈러스 등 미 대륙 곳곳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같은 이름으로 열리는 행사인데요.
우리 자동차 동호회 '정모나 벙개'와 비슷하지만 브랜드 또는 모델이나 특정한 성격의 자동차로 제한하지 않고 별의별 차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필리핀 등 전 세계 27개 나라에서 카즈 앤 커피 모임이 매월 마지막 주 열리고 있습니다.
모이는 장소에 따라 특정 브랜드가 주축이 되기도 하고 조금씩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 시간으로 지난 23일(토) 찾은 LA 서부 샌 클레멘테의 카즈 앤 커피에는 1900년대 초반 생산된 클래식카부터 요즘의 슈퍼카와 요란한 튜닝카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자동차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곳 아웃렛 주차장 한쪽을 가득 메울 만큼 웬만한 자동차 전시회나 클래식카 행사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1964년식 재규어 E 타입(Series I 로드스터)을 가지고 온 차주는 "자동차를 어떻게 소유하게 됐는지, 누구의 차였는지 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잘 복원한 클래식카나 마음에 드는 차를 현장에서 사고 팔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페라리와 포르쉐, 쉐보레와 포드, 재규어, 뷰익 등은 물론 지금은 사라진 브랜드의 클래식카는 물론 슈퍼카와 튜닝카까지 다양한 자동차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라이더의 성지로 불리는 로스앤젤레스 동북쪽 엔젤레스 크레스트 하이웨이(Angeles crest hwy)는 이번 일정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무려 100km 넘는 길이에서 와인딩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해발 수 천m의 산악도로에서 자신의 자동차 또는 바이크가 가진 한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곳은 파시피코 남서쪽 라 카냐다 플린트리지(La Cañada Flintridge)를 출발, 앤젤레스 국유림을 가로질러 경사와 코너가 반대편 피논 힐스(Pinon Hils)까지 100km 넘게 이어지는 산악 도로입니다.
고성능 슈퍼카를 갖고 있어도 서킷이 아니면 시속 11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없고, 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설치했다는 과속방지턱 때문에 코너링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고 따라서 자동차가 갖고 있는 성능을 제대로 체험하기 힘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 없이 부러웠습니다. 물론 안전사고가 잦아 이곳에서도 규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출발지인 라 카냐다 플린트리에서 30km가량 떨어진 뉴콤 랜치(Newcombs ranch)에서 고성능 슈퍼카와 튜닝카가 굉음을 내며 마음껏 질주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또 하나 부러운 것은 자동차 공유 서비스가 별다른 규제 없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LA에서의 2주간 지내면서 일행의 발이 되어준 기아차 카니발(여기서는 세도나)은 개인 승용차를 공유하는 튜로(TURO)에서 빌렸는데요. 카니발 말고도 몇 대의 개인 승용차도 이 튜로에서 빌려 이용을 했습니다.
개인차를 빌려주고 비용을 받는다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적어도 LA에서는 택시보다 우버, 렌터카보다는 튜로의 이용이 일반화돼 있었습니다. 일종의 카풀로도 볼 수 있는 튜로는 플랫폼을 통해 소유자와 이용자를 연결해 누구나(외국인을 포함해) 원하는 차를 원하는 기간만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국산차 찾기, 엘란트라와 쏘울 그리고 니로

LA에서 국산차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서울에서 BMW나 벤츠를 보듯 흔합니다. 국산차의 미국 진출은 1986년 현대차 포니 엑셀로 시작했죠. 첫해 16만8000대를 팔면서 '현대차' 돌풍을 일으켰지만 품질 문제로 수모를 당했고 정몽구 회장의 '품질경영'을 기반으로 2015년 미국 진출 29년 만에 누적 100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기아차와 함께 연간 130만대를 팔아 치우고 있고 연간 판매 기준 브랜드 순위 7위에 포진해 있습니다.
적어도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대차, 기아차의 여러 모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현대차는 56만대, 기아차는 51만대를 팔았고 이 가운데 현지에서 엘란트라로 팔리는 현대차 아반떼가 14만대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투싼(11만대)과 싼타페(10만대)도 월평균 1만 대 이상 팔리고 있죠.
그런데 LA 어디를 가나 가장 자주 만나는 모델은 기아차 쏘울이었습니다. 판매 대수는 8만대를 조금 넘기고 있지만 독특한 생김새 때문에 더 쉽게 눈에 띄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차 아반떼와 쏘나타, 투싼, 팰리세이드, 그리고 기아차 K5와 텔루라이드는 물론이고 니로와 쏘울 EV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유명 피자 체인점에서는 기아차 니로를 배달용 자동차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토요타와 혼다, 닛산 등 일본 브랜드가 많기는 했지만 도심이나 주택가, 프리웨이 등 어느 곳에서나 국산차는 쉽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아쉬웠는데요. 미국은 시장을 주도하는 차종이 다목적 차량이고 아직은 벤츠, BWM, 아우디, 렉서스 등 기존 프리미엄 브랜드의 벽을 넘기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LA에서의 2주간 자동차 문화 체험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LA 오토쇼를 취재했고 완성차 브랜드의 LA 디자인센터를 찾아가 인터뷰도 진행했는데요.
오토헤럴드가 이곳 LA에서 준비한 기사의 수가 짧은 기간 30개를 넘겼습니다(전체 기사 보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카즈 앤 커피나 앤젤레스 크레스트 하이웨이와 같이 자동차를 문화의 한 장르로 즐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튜닝카 정도는 흔한 것이고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다시 자녀로 대물림된 오래된 자동차를 정성껏 관리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문화도 부러웠습니다. 규제나 민원에 막혀 멀쩡한 서킷이 문을 닫아야 하고 가치 있는 올드카를 매연이나 뿜는 노후 차라며 강제 폐차를 유도하는 편의적 행정으로는 꿈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LA 특급 에피소드 몰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