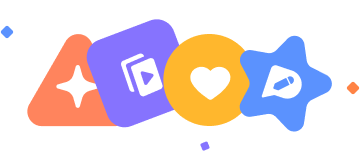살아생전엔 큰 주목을 받지 못한 테라칸.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꽃을 활짝 피웠다

테라칸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양반집 귀한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살기 위해 처절하게 발버둥 치다 결국 짧은 생을 마감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테라칸 개발 프로젝트는 현대정공(현대모비스의 전신)에서 싹을 틔웠다. 갤로퍼로 국내 SUV 시장의 지평을 넓힌 정몽구 회장(당시 현대정공 사장)은 그 뒤를 이을 차세대 SUV 개발을 지시했다. 애착도 대단했다. 갤로퍼를 성공으로 이끈 덕분에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으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명은 HP. 항간에는 ‘회장님 프로젝트’의 줄임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개발이 한창이던 1997년, 현대정공은 서울모터쇼에서 중간 결과물을 공개했다. 콘셉트카의 이름은 LUV. 베라크루즈를 떠올리고 ‘Luxury Utility Vehicle’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정공은 LUV를 ‘Limusine Utility Vehicle’로 설명했다. 완성차에 가까운 모습에 출시가 임박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때 아닌 외환위기로 계획에 차질을 빚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정공의 자동차제작사업부가 현대자동차로 통합되고, 기아차를 인수하는 등 복잡한 집안 사정 탓에 테라칸 프로젝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현대차가 개발을 맡은 뒤 LUV 디자인은 큰 변화를 겪는다. 1999년 서울모터쇼에서 공개한 하이랜드 콘셉트는 오프로더 성격이 짙었다. LUV를 바탕 삼고 보다 강인한 인상을 전하는 요소를 더했다. 테일게이트에 추가한 스페어타이어도 이와 흐름을 같이 한다. 엠블럼 또한 현대정공의 고풍스러운 H 로고에서 지금의 현대차 엠블럼으로 모양을 바꿨다. 대중의 반응은 꽤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출시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았다. 갤로퍼 후속 프로젝트는 소리소문없이 사장되는 듯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정몽구 회장은 칼을 빼 들었다. 자신이 사활을 걸고 개발한 갤로퍼가 후계자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허락할 수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2001년 2월, 프로젝트 HP의 결과물이 세상 빛을 보았다. 이름은 테라칸. 대지의 제왕이라는 뜻으로 SUV 세계의 최상위 포식자라는 의미를 은근슬쩍 내비쳤다. 디자인은 현대정공이 처음 그렸던 LUV 모습에 가까웠다. 테라칸에 앞서 등장한 싼타페가 호평을 받고 있는 점에 주목해 정통 오프로더를 고수하기보단 도심형 SUV로 변화를 택했다.

보닛 아래에는 직렬 4기통 2.5L 디젤 터보 엔진이 자리 잡았다. 최고출력 103마력, 최대토크는 24 kg·m에 이르렀다. 변속기는 5단 수동 또는 4단 자동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었다. 굴림방식은 파트타임 네바퀴굴림을 기본으로 했다. 상위 트림에선 상시 네바퀴굴림, 즉 AWD를 선택할 수 있었다. 당시 국산차 시장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고급장비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V6 3.5L 가솔린 엔진 또한 선택할 수 있었다. 현대차는 에쿠스의 심장을 테라칸에 이식해 고급차 이미지를 불어넣었다. 3470만원에 달하는 가격까지 에쿠스를 넘봤다. 당시 에쿠스의 최하위 트림인 GS300의 가격이 3575만원이었다.

큰 인기 높던 갤로퍼의 후광효과 때문인지 테라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정식 판매 이후 하루 평균 500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문이 폭주했다. 일부 모델의 경우 계약 후 차를 받기까지 두 달 이상 걸리기도 했다. 이대로라면 현대차가 목표로 정한 연간 판매량 3만5000대 달성은 문제가 없어 보였다. 당시 현대차는 싼타페와 테라칸을 앞세워 국내 SUV 시장 점유율 55% 달성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잔치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출시 후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위기를 맞았다.

부족한 출력이 문제였다. 갤로퍼부터 이어온 구식 터보 인터쿨러 엔진은 2t이 넘는 테라칸을 끌기에 무리였다. 힘이 부족해 엔진회전수를 높이다 보니 높은 연료효율을 기대하기도 힘들었다. 설상가상으로 2001년 8월, 쌍용자동차가 16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야심작 렉스턴이 출시하며 테라칸은 절벽 끝으로 내몰렸다. 출력은 물론 내∙외관 디자인도 렉스턴에 뒤처진다는 혹평이 쏟아졌다. 현대차는 서둘러 최고출력 150마력 직렬 4기통 2.9L CRDi 엔진으로 응수했지만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21년 9월까지 내수시장 목표 판매량이었던 3만5000대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다. 반면 쌍용차는 렉스턴을 출시 한 달 만에 2348대를 판매하고도 주문이 7000여 대나 밀려 생산라인 증설 계획을 세웠다. 결국 테라칸은 라비타와 함께 비인기 차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당시 현대차 관계자는 가격은 높은데 고급차 이미지를 끌어내지 못한 점을 판매 부진의 주요인으로 꼬집었다. 출시 이듬해인 2002년 5월,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블랙 원톤으로 마감한 최상위 트림 블랙 스페셜을 선보인 이유도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테라칸은 시대를 잘못 만난 게 분명하다. 경쟁자 렉스턴은 끝까지 발목을 잡았다. 2003년 12월, 테라칸이 출력을 165마력으로 높이고 동급 최강 자리에 오르자마자 렉스턴은 3일 만에 170마력의 커먼레인 XDi 270으로 맞불을 놓았다. 현대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불과 6개월 만에 175마력으로 다시 한번 출력을 업데이트한다. 테라칸과 렉스턴은 상품성 개선이라는 끝이 없는 굴레 속에서 서로를 견제했다. 테라칸은 마치 김연아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아사다 마오 같았다.


두 모델의 출력 경쟁은 2006년 쌍용차가 191마력 렉스턴2를 선보이면서 끝이 났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했던가. 승리는 렉스턴의 몫이었다. 같은 해 10월, 테라칸은 베라크루즈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생을 마감했다. 5년간 판매량은 국내외를 모두 합쳐 21만6000여 대에 그쳤다. 짧은 시간 동안 4회에 걸친 출력 개선, 2회의 페이스리프트에도 불구하고 최종 성적은 초라했다. 살아생전 ‘대지의 제왕’이라는 장엄한 이름을 제대로 날리지 못했다. 치열하게 살긴 했지만 끝내 태평성대를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진심은 통한다고 테라칸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빛을 발하고 있다. 네모반듯한 디자인은 출시 당시 시대에 뒤처진다고 놀림 받았지만, 최근 레트로 디자인 유행 바람을 타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와 달리 당시 모던한 디자인으로 호평받았던 렉스턴은 촌스러운 티가 역력하다. 파워트레인에 대한 평가도 상황이 역전되었다. 판매 당시 테라칸의 엔진은 출력 모자란 구식이라며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오늘날에는 힘은 모자라도 내구성과 정비성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매연저감장치 장착도 가능해 갤로퍼를 대체하는 모델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사실 파워플러스 모델은 힘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36kg·m에 이르는 최대토크를 바탕으로 초반 가속이 꽤나 가뿐하다. 배기량이 높아 고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속도를 높인다.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긴 하지만 그만큼 기름을 많이 먹는다. 4단에 불과한 변속기 탓에 시속 100km가 넘으면 엔진 회전수는 3000rpm에 달한다. 그래도 정속 주행 시엔 1L에 10km는 달릴 수 있다. 문제는 시내 주행이다. 연료탱크에 기름 70L를 넣고 400km도 채 달리지 못한 적도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변속기 기어를 잘게 나누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무엇보다 테라칸이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프레임 보디 SUV라는 점 때문이다. 사다리 모양 철골 위에 차체를 얹는 방식을 보디 온 프레임이라고 일컫는데, 차체 강성이 뛰어나 오프로드 주행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오프로드 튜닝에도 적합하다. 신발에 키높이 깔창 집어넣듯 프레임과 차체 사이에 철골만 끼워 넣으면 지상고를 최대 10cm까지 높일 수 있다. 지상고를 높이고 타이어만 올터레인 또는 머드로 바꿔도 웬만한 오프로드 주행은 식은 죽 먹기다. 든든한 네바퀴굴림 시스템과 짝을 이뤄 성큼성큼 정상을 향해 오른다.


적재공간 또한 넉넉해 캠핑용으로도 제격이다. 2열 시트는 폴딩은 물론 바닥 시트를 앞으로 들어 올려 젖힐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양문형 냉장고도 꿀꺽 집어 삼킨다. 당근마켓 중고거래용으로 좋을 듯하다. 공간은 무척이나 넓지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캠핑용으로는 추천하지 않는다. 오래전 프레임 보디 SUV라서 뒷좌석 승차감이 크게 떨어지는 까닭이다. 크기에 상관 없이 요철을 지날 때면 진동이 시트 전체에 퍼진다. 누더기 같은 도로라도 만나면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기대고 있지 못할 정도다. 화물차라고 생각하고 되도록 1열에만 앉는 편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라칸은 사랑스럽기 그지없다. 사각턱 얼굴은 메르세데스-벤츠 G-클래스 부럽지 않고, 믿음직한 오프로드 주행 성능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다. 무엇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미를 즐길 수 있어서 좋다. 큰마음 먹고 산 차로는 진흙탕에 내던지고 나뭇가지 사이로 뛰어드는 주행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테라칸은 찻값도 저렴하고 수리비도 부담 없어 마음껏 뛰놀아도 좋다. 만약 오프로드 주행 또는 오버랜딩 캠핑을 함께 할 동반자를 찾고 있다면 훌륭한 선택지다. 구매하기 전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부식이 심한 차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거르길 바란다.

글 이현성 사진 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