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위험성, 낮으나 높으나 보증료율은 왜 똑같나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고위험 가입자의 손실을 저위험 가입자가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약 30%가 부채비율 90%가 넘는 깡통전세 위험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경준 의원 "리스크 비례해 보증료율 책정해야"

주택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고위험 가입자의 손실을 저위험 가입자가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약 30%가 부채비율 90%가 넘는 깡통전세 위험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2018년 17%에서 2019년 18.4%, 2020년 22.4%, 2021년 26.3%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부채비율별 사고율을 살펴보면 부채비율 70% 이하 0.4%, 70~80% 0.7%, 80~90% 1.4%에 불과했지만, 깡통전세 위험 주택(부채비율 90% 초과)의 사고율은 9.4%로 다른 구간에 비해 최소 7배에서 최대 24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료율 차이가 거의 없어 고위험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저위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민간 보험업계에서는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건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최대 더 내고, 무사고 기간이 길거나 주행량이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 차등폭은 최대 162%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HUG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 부채비율 등에 따라 1년에 최소 0.115%에서 최대 0.154%이며, 부채비율에 따른 차등 폭은 0.013~0.015%p에 불과했다.
고위험 깡통전세 주택 증가로 인해 보증사고 숫자도 늘다 보니 HUG에서 대위변제를 한 금액도 2017년 기준 34억원에서 2021년에 504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6020억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HUG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보증 운용 배수는 2024년 법적 보증 가능 범위인 60배를 넘어 64.6배가 예상돼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준 의원은 "현재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중단까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증 운용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부채비율에 따른 리스크에 비례해 보증료율을 책정하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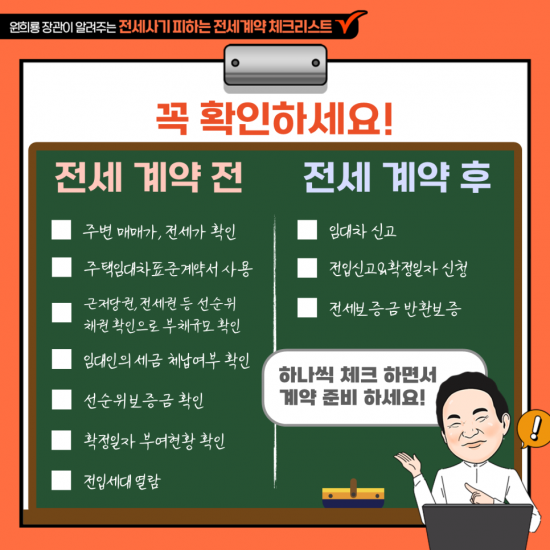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기가 뼈처럼 굳는다…길 가다 넘어져 응급실 간 60대 男 '화들짝' - 아시아경제
- '총 65억' 로또 1등 4장이 한 곳서…당첨자는 동일인으로 추정 - 아시아경제
- "속옷 안 입고 운동하는 女 때문에 성병 옮아"…헬스장 전파 진실은? - 아시아경제
- "전세방 빼서라도 尹 도와야…이번 계엄은 쇼" 전광훈 목사 주장 - 아시아경제
- 성탄절 무료급식 받으러 성당 갔다가…압사 사고에 침통한 나이지리아 - 아시아경제
- "빚이 69억이라"…경매 나온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뜨거운 관심 - 아시아경제
- 10억원 이상 가진 한국 부자 46만명…42세에 7.4억 종잣돈 모았다 - 아시아경제
- "엄마 영웅이 영화 보고 올게"…'100억원 돌파' 시니어 팬덤의 위력[2024 콘텐츠②] - 아시아경제
- "온라인에서 사면 반값이잖아"…믿었던 '공식판매처'가 가짜였다[헛다리경제] - 아시아경제
- "사우디 왕자랑 결혼, 이주할 거라 싸게 판다"…'중동 공주'라고 불리던 中 여성들 정체 - 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