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피하자니, 14일 해상격리…러 가는 오징어배 애탄다
국민간식 오징어의 ‘코로나19 수난기’
中 어선 없었다면 러시아 안 가도 될 텐데….
지난달 31일 오전 5시 강원 속초시 동명동 속초항. 2박3일 동안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마친 29t급 창흥호가 어둠 속을 뚫고 환한 빛을 비추며 항구로 들어왔다. 정박한 창흥호에서 내려진 오징어는 220두름. 한 두름이 20마리씩이니 총 4400마리다. 이날 오징어는 한 두름에 5만원 안팎에 팔렸다.
모처럼 풍어에 기쁠 만도 했지만, 선장 김진환(65)씨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다. 김씨는 “오징어가 최근 5~6년보다 잘 잡히는 건 맞는데 역시 예년만 못하다”며 “동해에서 잡는 건 한계가 있어 7월엔 러시아로 넘어가 조업을 하려는 데 걸림돌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한 번 가는데 억대 경비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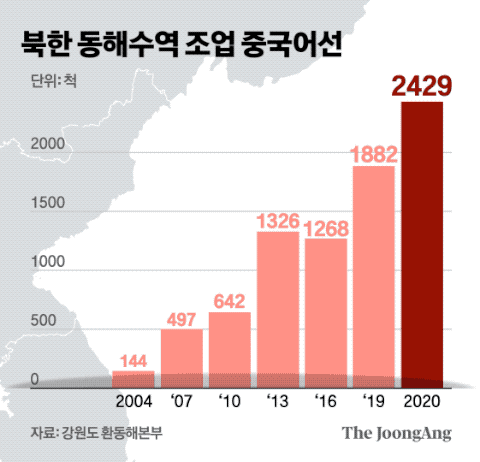
김씨가 말한 걸림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해상 격리’다. 국내 어선이 러시아 원정 조업에 나서려면 바다 위에서 14일간 해상 격리를 해야 한다. 러시아 감독관이 배에 올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러시아 원정 조업을 하려면 한 척당 조업료가 2800만원에 달하는 데다 기름값과 부식비까지 합치면 억대 경비가 든다”며 “바다에서 조업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 4월에는 해양수산부와 러시아연방수산청이 한·러 어업위원회 협상을 통해 선원 전원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해상 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다. 러시아로 원정 조업을 가는 오징어 배 선원 대부분이 외국인 선원이어서 백신 접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1년 이상 국내에 머문 외국인들만 백신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배 타려는 한국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쓰는데 1년 이상 체류한 선원은 되고 최근에 들어온 선원은 안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89t급 채낚기 어선 선주인 이돌암(71)씨도 “해상 격리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다. 선원 8명 중 2명이 지난달에야 국내에 들어와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다. 이씨는 “러시아에 들어갈 때 감독관이 배에 올라와 구비서류와 폐기물 소각장 등을 점검하는데 한 명이라도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있으면 조업을 할 수 없다”며 “14일이나 조업을 못 하면 돈도 돈이지만 어기를 놓칠 수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해상 격리, 날씨 영향 한 달 이상 조업 못 해


강원도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오는 7월 초부터 러시아로 원정 조업을 가는 오징어 배는 24척. 하지만 선원 전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배는 2척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썬 러시아 원정 조업에 나서는 대부분의 배가 14일간 해상 격리를 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20척이 각각 조업료 2300만원을 내고 러시아 원정 조업에 나섰다가 해상 격리와 날씨의 영향 등으로 한 달 이상 조업을 못했다. 이 바람에 조업 시기를 놓쳐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갈수록 줄어드는 오징어 개체 수도 걱정거리다. 지난해부터 “동해안 오징어가 풍년”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최근 5~6년과 비교해 늘어났을 뿐 예년에 비해선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7229t으로 2019년 4022t보다 79%(3207t) 늘어났다. 하지만 20여년 전인 2000년대에 한해 2만~3만t씩 오징어가 잡힌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수준까지 줄었다.
이날 속초항에 들어온 배 중엔 오징어 10두름(200마리) 정도를 잡은 배들도 있었다. 그나마 100두름 이상 잡은 배들은 6~7시간가량 떨어진 먼바다에서 조업을 한 배들이었다.
태흥호 선장 박용철(65)씨는 이날 선창가에 오징어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곧바로 다시 바다로 향했다. 박씨는 “6시간 정도 떨어진 동해 북쪽에서 2박3일 동안 오징어 4000마리를 잡았다”며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오징어가 잡힐지 몰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바다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징어 내려놓자마자 다시 바다로


어민들이 조업 시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오징어가 북상 후 남하하는 회유성 어종이어서다. 오징어는 4~6월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성장하고, 7~9월은 동해 러시아 근해인 북측수역(북한)에 머물다가 10월부터 다시 우리나라 동해안을 거쳐 남하한다.
문제는 중국 쌍끌이어선이 7~9월 북한수역에서 오징어를 싹쓸이한다는 점이다. 중국 어선들이 가을철 남하하는 오징어를 대형 그물로 모조리 잡는 바람에 동해 오징어 씨가 말라가는 상황이다. 어민들은 “중국 어선의 북한 동해 수역 입어 계약이 체결된 2004년 이후 매년 중국 어선이 기승을 부리면서 오징어 어획량 자체가 확 줄었다. 러시아 원정 조업도 중국 어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강원도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2004년 계약 체결 당시 조업을 시작한 중국 어선은 144척이었다. 당시만 해도 강원지역 오징어 어획량은 2만2243t이었다. 이후 2011년 중국 어선이 1299척으로 늘어나자 오징어 어획량이 1만4343t으로 줄었다. 2014년엔 중국 어선이 1904척까지 불어나면서 오징어 어획량은 처음으로 1만t 아래로 떨어진 9461t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중국 어선이 2161척으로 늘자 4146t으로 반 토막 났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인 2429척의 중국 어선이 북한 동해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동해안 어민들은 “오징어도 국민 생선 명태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명태는 1970~80년대 강원도 동해안에서 주로 잡혔지만, 지금은 자취를 감춘 상태다.
명태처럼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


그렇다면 지난해 북한 동해 수역에서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오징어 어획량이 증가했던 이유는 뭘까. 지난해 동해 연안 수온은 전·평년대비 2~5도 높게 형성되면서 오징어의 생육에 적합한 16~18도가 유지됐다.
동해 연안의 수온이 오르면서 ‘당일바리’(저녁에 출항해 다음 날 새벽 입항) 조업이 가능해진 것도 어획량 증가에 한몫을 했다. 기존의 채낚기와 정치망 어선 등 큰 어선들이 6~8시간 떨어진 해상에서 2박3일 간 조업할 때보다 조업비용도 크게 줄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19년 가을 오징어 유생조사 결과 2016~2018년에 비해 유생의 분포밀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오징어 유생은 지난해 5~6월 북상한 오징어가 태어난 시기를 의미한다. 여기에 오징어 성장 시기인 지난해 4월 주요 먹이생물인 동물플랑크톤 밀도도 전·평년대비 높게 나왔다.
김중진 국립수산과학원 박사는 “6월 동해 수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지난해 가을 오징어 유생밀도도 전·평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올해 어황도 평년수준 이상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동해 연안 수온분포는 냉수대 발생 등의 영향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연안 수온의 변동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속초=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 '일타강사'에 흉기 위협 男…도주 몇시간 뒤 숨진채 발견 | 중앙일보
- '삼풍 참사'로 딸 셋 잃고 세운 장학재단…정광진 변호사 별세 | 중앙일보
- 70대 몰던 승용차 인도 돌진…중학생 이어 고교생도 숨졌다 | 중앙일보
- "싫다는데 낙태 강요하더니…수술 한달후 파혼 통보한 예비시댁" | 중앙일보
- "한두개만 먹으면 배 찬다"…북한 주민 홀린 '사자머리 고추밥' | 중앙일보
- 내 집에 웬 남자가 30분간 7번 들락날락…홈캠 설치한 여성 깜짝 | 중앙일보
- "역대급 수영복 표지" 82세 최고령 여성 모델의 정체 | 중앙일보
- 가슴 납작, 사타구니 불룩…아디다스 성소수자 수영복 발칵 | 중앙일보
- 안드로이드 인수 기회 또 오면? 삼성 사장단에 다시 물었다 | 중앙일보
- "10분 앉아있으면 보수 1만원" 중국 유학생 '대리수강' 판친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