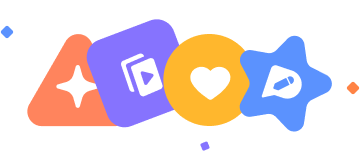이 사진을 보라.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놀이터, 지하 주차장, 마트..인가 싶었는데 왠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 그런데 식당 이름이 야인시대?

사실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몽골인데 자세히 보면 주로 고층건물에 빵집이나 카페가 입주해있는 한국과는 다르게 대부분 단층 건물이고, 사람들 외모도 한국사람과 비슷한듯 하면서도 다르게 생겼다. 그래도 마치 한국의 신도시를 옮겨놓은듯한 모습에 몽탄신도시라는 말까지 나온 몽골. 유튜브 댓글로 “몽골은 왜 한국이랑 비슷해 지는지 알려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몽골이 ‘한국형’ 건물들을 만들기 시작한 건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수도 울란바타르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 대초원에 세운 ‘야르막 신도시’ 프로젝트다. 울란바타르 외곽 야르막 지역의 300만평 부지에 아파트와 상가들을 2020년까지 짓기로 하면서 지금의 한국형 아파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사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몽골 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 신도시 개발 노하우들을 수출했다. 몽골 뿐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예멘 신도시 개발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민간 건설사들도 참여했다고 한다. 다만 최근 몽골 여행후기를 보면 이 야르막 지역 교통체증을 언급하는 글도 종종 보이는데 신도시 건설 이후에도 인구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은 어쩔 수 없나보다.

참고로 몽골의 수도인 이 ‘울란바타르’ 지역. 국립국어원에 표준어로 검색해보니 ‘울란바토르’라고 나오는데, 한국외대 몽골어학과의 뭉크나산 교수님에게 물어봤더니, 장음이 섞인 ‘울란바타르’가 좀 더 몽골 현지 발음에 가깝다고 한다.
한국외대 뭉크나산 교수
“(울란)바타르 라고 하면 맞고요. 몽골말로. (울란)바토르라고 하면 그거 러시아식 발음 맞아요. 몽골 전보를 옛날에 한국에서 바로 받지 못하고 러시아 자료를 많이 받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실 몽골도 1990년 정식 수교 이후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발전시켜왔다. 800년 전의 역사를 떠나서도 한국과 몽골 사이에는 역사적 공감대가 있다는 것이 몽골학자인 박소현 교수의 설명.
한국몽골학회장 박소현 영남대 교수
“우리도 분단 조국이지만 몽골도 내몽골 중국에 내주고, 부리야트 공화국 러시아에 내줬고, 어떻게 보면 그쪽은 이제 분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경을 사이에 두고 같은 민족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좀 있고요. (그래서) 한국 꺼가 유입되는 것에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한류의 영향도 컸다. 레전드로 알려진 드라마 야인시대는 현 시청률이 80%였다고 몽골 국민배우가 된 안재모가 말한 바 있고, 몽골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땅을 주겠다고 해서 차타고 비포장도로를 몇시간이나 달려간 적이 있다고 했을 정도다.

약 30년간 한류 문화가 꾸준히 몽골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한국 편의점과 대형마트도 대거 입점하기 시작했다. 2023년 기준 CU편의점은 320여 개, GS25는 100여 개가 운영 중이고, 몽골 최초의 대형쇼핑몰이었던 이마트는 올해 9월 4호점 개장을 앞두고 있다.

‘국뽕’으로 과장해서 해석되는 건 아닌지 물어봤더니 뭉크나산 교수님은 한국에 대한 몽골인들의 애정은 근거있는 설명이라고 했다.
한국외대 뭉크나산 교수
“한국에서 지금 몽골사람이 5만 명 이상이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돈 벌면서 몽골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한국은 몽골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나라다. 이런 인식도 있고, 몽골 옆에는 중국이 있어가지고 중국 제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한국 제품은 질이 중국 제품보다 훨씬 좋잖아요. 음식 같은것도 맛있고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밖에 없죠.”

물론 모든 몽골 사람들이 다 한국을 좋아하는 것처럼 봐서는 곤란하다.
한국외대 뭉크나산 교수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도) 제품이나 물건이나 이런저런 기술이나 나라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런 풍경,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앞으로 더 이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2020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몽골주택공사와 MOU를 맺으면서 몽골에서 2025년까지 15평형 5천세대 규모의 한국형 주거단지를 지을 계획이다.

또 인구의 절반이 수도 울란바타르에 몰려있어서 지방 분권정책 시행을 위해 쿠시그밸리라는 곳을 행정중심지로 개발중인데, 몽골은 이 신도시의 모델로 ‘세종시’를 참고했다고 발표했다. 응? 음...암튼 그렇다고 한다.
세종시 관계자
“첨단 기술도 들어가 있고 스마트 도시나 여러 부분에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노하우들이 세종시에 많이 축적되어있다’ (몽골측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회자되듯이 13세기 고려의 풍습이 원나라에서 유행했던 ‘고려양’의 재현으로 불리든, 몽탄신도시로 불리든 몽골의 한국 따라하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사실 국내 신도시 건설은 할때마다 잡음이 많은데 몽골에서 한국의 장점만 잘 따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