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공식 회식에서 직원이 평소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셔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까?
대법원에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
회식에서의 과음이 사고로 이어지는데 업무 관련성이 있었는지를 따져 보고, 관련성이 있고, 그것이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라고 인정된다면, '산재 처리'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식 음주 사망사고라도 산업재해가 아닌 경우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에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법원 판단은 갈린다.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동료 직원들과 약 5시간에 걸쳐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했다.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던 A씨는 회식이 끝나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기숙사로 돌아가려 했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05%로 만취 상태였다.
A씨의 아내 B씨는 만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업무의 연장인 회식 후 퇴근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것이니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와 업무의 연장인 회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어 사회통념상 A씨가 수행한 업무의 연장이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가 종료된 후 퇴근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라고 전제하면서도 "사고가 죽은 A씨의 만취운전으로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의 사고는 만취운전에서 비롯된 것이고, 회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지만 그 업무수행과 A씨가 사망하게 된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즉 회식에서의 음주는 업무의 연장이지만 이후 음주운전은 본인 책임이라는 취지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한 A씨의 아내 B씨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으로 인해 패소했다.

하지만 유사한 사건 중에는 회식 술자리 과음으로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회식 술자리 중이나 이후에 사고가 났다고 해 무조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인 것은 아니란 것이다.
대법원 인정 기준인 '사업주 측의 음주 강요여부'나 '회식 당시 구체적 상황'이 사고가 발생케 한 직접 원인이 되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 측은 업무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산업재해의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사고발생시 증거나 증인확보에 힘을 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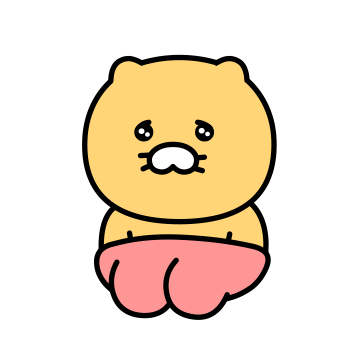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 중에는 회식 술자리 과음으로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회식 술자리 중이나 이후에 사고가 났다고 해 무조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인 것은 아니란 것이다. 때문에 대법원의 인정 기준인 사업주 측의 음주 강요여부나 회식 당시 구체적 상황이 사고가 발생케 한 직접 원인이 되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근로자 측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여러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해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의 입증책임은 여전히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명심해 사고발생시 증거나 증인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