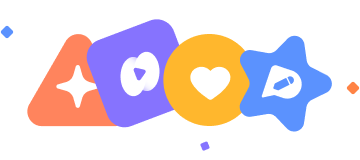오늘 우리가 주고받은 데이터의 용량은 얼마나 될까? IT 기술이 발달할수록 개개인이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스마트폰으로 열어보는 이미지, 스트리밍으로 듣는 음악 등 알게 모르게 쌓여가는 데이터의 양은 수십 MB에서 GB까지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는 MB도 아닌 KB 단위의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PC와 PC를 연결하는 인터넷이 없었으므로 대학교 과제 제출이나 포트폴리오를 정리한다든지, 회사에서 관리하는 백업 데이터를 다른 장소로 옮길 때 특별한 수단이 필요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흔한 데이터 이동 수단은 플로피 디스켓이다. 가령 5.25인치 2D 디스켓의 경우 최대 362,496 바이트 데이터를 담을 수 있었고 3.5인치 디스켓의 최대용량은 1.44MB까지였다. 필자가 기억하는 상황은 이랬다. 1992년에서 1993년 사이 가장 흔하게 판매되는 하드디스크의 용량은 무려 40MB, OS로 MS-DOS 6.1을 세팅한 후 동서게임채널에서 출시한 인디아나존스 4 : 아틀란티스의 운명을 설치하면 여유 공간이 거의 없이 하드디스크가 꽉 찰 정도였다.

이때 인디아나존스 4의 패키지는 1.2MB 짜리 5.25인치 2HD 디스켓 6장으로 구성되었었다. 시에라의 킹스퀘스트 6는 무려 2HD 12장으로 구성되었던 게 기억난다. 극악의 스펙 요구로 유명했던 오리진의 1993년작 윙커맨더 : 프라이버티어도 설치 용량이 7.75MB 정도 되었으니 하드디스크의 거의 1/4을 차지할 정도였다.

하여 저작권 개념이 전혀 없던 학창 시절, 친구들끼리 PC 게임을 주고받는 일은 플로피 디스켓을 박스째로 주고받는 거래로 여겨졌었다. SKC의 저렴한 디스켓 박스나, 좀 사는 집 자제들의 회색 3M 디스켓 박스는 우정의 상징이자 대용량 데이터 이동의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인지되었었다.
하지만, 옮기는 데이터의 용량이 분할 압축해 디스켓 여러 장으로 소화하기 힘들게 방대해지면서 특별한 대용량 미디어의 수요가 높아져갔다. 당시 28.8K 전화 접속 모뎀의 경우 1MB 데이터를 내려받는 데 1시간이 걸리던 시기니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기에, 대용량 미디어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기만 했다.

시간이 지나며 가장 대중화된 대용량 미디어는 바로 CD였다. 흔히 공 CD라 불리며 광학 드라이브에서 "구워서" 데이터를 저장시키던 미디어였다. 700MB라는 넉넉한 용량은 게임이나 동영상, MP3 여러 곡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었고 라벨링이나 특별한 케이스로 소장하는 재미까지 있어서 학생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공 CD는 학생들에겐 거의 1급 재산으로 인지될 정도로 미디어 한 장 한 장의 가격이 높았고, 한 번 기록하면 변경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물론 재사용이 가능한 CD-RW도 개발되었으나 광학 드라이브, 미디어 간의 호환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가격도 높아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CD가 등장하기 전엔 어떤 대용량 미디어가 있었을까? 1994년, Iomega라는 회사에서 100MB 단위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ZIP 드라이브를 세상에 선보였다. 미디어 제작은 후지필름이 담당했는데 ATOMM(Advanced super Thin Layer & Hihg Output Metal Media) 기술을 적용해 디스켓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처음 나온 미디어의 용량은 100MB, 3.5인치 2DD 70장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해를 거듭하며 미디어의 용량은 커졌는데, 1999년 250MB, 2002년엔 750MB까지 늘어났다.

거대한 디스켓처럼 생긴 미디어는 ZIP 전용 드라이브에 넣어 사용했다. 대부분 내장형 드라이브를 사용했던 CD와는 달리 대부분 외장형이었고, 충격에 강한 미디어와 함께 들고 다니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전용 외장 드라이브는 PC에 병렬 포트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플로피 디스켓보다 살짝 빠른 정도의 속도를 보였다. 물론 나중엔 SCSI용 ZIP 드라이브까지 개발되어 속도가 높아졌긴 하지만, 당시 IBM-PC용 SCSI 컨트롤러는 PC 한 대 값을 호가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사용자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그러고 보면 SCSI를 기본으로 제공했던 매킨토시의 선견지명이 상당히 놀라울뿐...
대학시절 영상이 전공이었던 필자는 당시 조교 선생님과 친해 NLE 편집 강의를 돕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실습 PC에 각각 80MB 정도의 소스들을 복사하는 게 주 미션이었는데, 이 때 ZIP 드라이브를 꽤 요긴하게 사용했었다. 하지만, 극악의 전송속도로 인해 PC 50대 들어가는 강의실 하나 세팅에 꼬박 반나절이 걸렸던 기억이 있다. 최종 결과는 ZIP 드라이브를 책상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고장내서 수리비로 알바비를 퉁치며 해고되었다.

ZIP 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성공 가도를 달리자 Iomega는 발 빠르게 Jaz 드라이브를 추가로 선보였다. 제일 용량이 큰 미디어도 750MB에 그쳤던 ZIP 드라이브와는 달리 처음부터 1GB, 2GB 용량으로 본격적인 기가바이트 시대의 서막을 알린 미디어이기도 했다. 플로피 디스켓의 기술을 작용한 ZIP과는 달리 Jaz는 하드디스크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용량도 커지고 전송 속도도 ZIP 보다 빨랐다. 용량이 10배나 커졌으니 ZIP 과 똑같은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 시간도 10배나 걸리는 게 당연한 일. 따라서 대역폭이 큰 SCSI 연결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ZIP과 Jaz는 대용량 데이터 이동 수단으로써 그 임무를 충실히 다했지만, USB 드라이브와 초고속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파일 전송 속도와 편의성에서 새로운 미디어에 경쟁이 안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외장형 전용 드라이브를 구동시켜야하는 것이 Nerd들의 '자랑템'이 아니라 번거로움의 상징이 되어버린 인식의 전환도 한 몫했다는 의견도 많다.

새로운 대용량 미디어 구입 비용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주로 3.5인치 외장 하드 케이스를 많이 사용했다. 지금이야 M.2 SSD의 날씬한 몸집(?)을 십분 활용해 예전 USB 드라이브 같은 크기의 외장 케이스가 많아졌지만, 당시 하드디스크를 직접 연결해 가지고 다니는 3.5인치 외장 하드 케이스는 거대한 항공모함급의 위엄을 자랑하곤 했다. 거의 1베이 NAS 급의 덩치였다.

USB-B 타입으로 외장 하드에 연결하고 PC 쪽은 USB-A로 연결하는 데이터 케이블과 동시에 220V 상용 콘센트에 연결해 전원을 공급하는 어댑터까지 따로 가지고 다녀야 해서 정말 번거로웠던 것은 사실이다. USB 방식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직렬 포트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속도도 엄청나게 느렸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장착해 용량을 활용하고, 케이스 자체의 가격이 다른 특수 미디어보다 저렴해 접근성이 뛰어났다. 다만, 하드디스크를 이용하다 보니, 외부 충격에 취약해 책상에서 한 번이라도 떨어뜨리면 온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현재도 쉽게 구할 수 있다.
▲ ZIP 드라이브를 아이폰에서 구동시키는 모습
<출처 : Youtube 'Will It Work?" 채널>
개개인이 다루거나 옮기는 데이터의 용량은 계속 커지고 있다. 메가바이트(MB)를 넘어 기가바이트(GB)로, 현재는 테라바이트(TB)라는 단위까지 아주 익숙해져버렸다. 시간이 지나면 개인이 페타바이트(PB), 나아가서는 엑사바이트(EB)까지 다루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예전처럼 데이터를 저장해 이동하는 미디어의 발달은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는 게 다수다.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과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용화로 굳이 물리적인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쉽지만, 이젠 추억의 부스러기로만 자리 잡은 '당시' 대용량 미디어의 존재는 이제 박물관에나 가야 직접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다. 3M 디스켓 한 통에 우정을 나누었던 그 시절이 그립다.
기획, 편집, 글 / 다나와 정도일 doil@cowave.kr
(c) 비교하고 잘 사는, 다나와 www.dana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