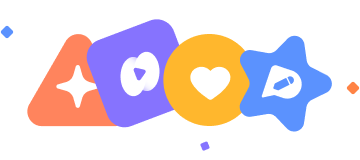[김효진의 팝, 그 빛과 그늘]
흑인노예의 나라 자메이카 '슬픈 사연'
아프리카 전통리듬과 R&B의 만남
정치지도자들 무대에 올려 화해시켜
36년 짧은 생, 평화와 화합의 상징처럼
지난 3월 13일에 개봉한 영화 <밥 말리 원러브>(리날도 마르쿠스 그린 감독)가 상영 막바지에 왔다. '레게의 사제' 혹은 신으로도 불리는 밥 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기 영화로는 드물게 1976년에서 1978년까지 그의 전성기만을 다루고 있어, 몇 마디 덧붙여 보려 한다.
체 게바라와 더불어 혁명과 저항의 아이콘으로 흔히 소비되며 포스터, 기념품 등의 사진으로 접해온 밥 말리가 대중음악에 미친 대단한 업적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우리는 그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이다.

밥 말리의 고향 자메이카의 슬픈 역사
국민의 대부분이 흑인이다 보니 아프리카로 흔히 착각하게 되지만 자메이카는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이다. 실제로 인구 90% 이상이 아프리카 혈통인 데에는 자메이카의 아픈 역사가 숨어있다.
콜럼버스가 처음 발견하여 스페인인들이 정착을 시작했을 때 그 침략자들의 전염병으로 원주민 대다수가 사망했다는 이야기까지는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이다. 살아남은 원주민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 노예로 착취당하며 거의 전멸에 이른다. 이에 부족해진 노동력을 아프리카에서 대거 끌고 온 흑인 노예들로 보충한다.
1655년 스페인은 자메이카를 영국에 빼앗기게 되는데 영국은 또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 사업을 벌이기 위해 더 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끌고 온다. 3백년 뒤 1962년 영연방으로 독립하기까지 자메이카의 역사는 말 그대로 노예의 역사였다.
카리브해 연안 국가 대부분이 1인 독재로 휘둘리는 데 반해 그나마 자메이카는 독립 후 의회 민주주의와 복수 정당제가 자리잡긴 했다. 그러나 인민민족당과 자메이카 노동당이 번갈아 정권을 잡고 치열하게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국가는 분열과 혼란으로 이어진다.

레게의 태동과 밥 말리의 등장
1990년대 한국에 때아닌 레게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다. 김건모 2집 수록곡 '핑계'의 히트가 불을 지폈다.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투투의 '1과 2분의 1', 신예 그룹 룰라의 노래들은 모두 레게 리듬을 차용했고 덩달아 레게 파마, 레게 바가 유행했다. 그때의 우리는 레게를 새롭게 유행하는 흥겨운 댄스 음악으로 받아들이고 가볍게 소비했던 것 같다.
핑계
그러나 레게는 이미 1970년대 전 세계를 풍미했던 장르다. 당시 제3세계로 불렸던 작은 섬나라의 음악이 미, 영이 주도했던 팝 시장을 흔들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은 본국의 전통 음악들을 한데 공유했을 것이고 이것이 자메이카 음악의 토대가 된다. 그렇지만 이 뿌리가 레게를 꽃피우는 데까지는 또 다른 사회적 흐름이 있었다.
1950년대 영국과 미국은 본토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 비교적 가까운 나라인 자메이카의 흑인들을 대거 유입시켰다. 이 이주노동자들은 미국의 리듬앤블루스(R&B)와 영국의 록 음악을 접하고 자국으로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프리카의 전통 리듬이 R&B, 록과 만나 이렇게 '스카'(ska)라는 장르를 탄생시켰다.
스카는 자메이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영미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 나갔다. 스카는 후에 박자가 살짝 느려지고 여러 효과가 가미되어 지금 우리가 아는 레게로 발전한다.
자메이카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음악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당시 10대였던 밥 말리가 그중 하나였던 것이다.

레게 그 자체인 밥 말리
레게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밥 말리다. 그냥 밥 말리가 레게다. 하나의 장르가 단 한 사람으로 치환되는 거의 유일한 경우가 아닐까. 소위 제3세계의 아티스트가 팝 음악계에 새로운 장르를 열어준 유일한 경우이기도 하다.
밥 말리는 중년의 백인 남성과 19세의 가난한 흑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나 아버지에게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상태로 불우하게 자랐다. 빈민가의 흔한 흑인 중 하나였을 밥 말리가 36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통해 어떻게 전 세계를 사로잡게 되었을까.
One Love / People Get Ready
당연한 얘기지만 그가 알려지기 시작한 건 우선 좋은 음악 때문이다. 'No woman no cry'나 'One love' 등은 역사고 의미고 몰라도 누가 들어도 아름다운 음악이지 않은가. 거기에 에릭 클랩튼이 커버한 'I Shot The Sheriff'의 대히트가 그를 알리는 데에 큰 몫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시대의 아이콘으로까지 이른 데에는 설명이 더 필요하다.
음악적 동료이자 아내인 리타 앤더슨을 통해 밥 말리가 빠져들었던 자메이카의 신흥 종교 라스타파리교(敎)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다. (우리가 레게파마라고 알고 있는 그의 드래드락 헤어는 라스타파리교의 징표이기도 하다)
레게의 메시지: 평화와 화합
살아있는 에티오피아의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를 예수의 재림으로 여기고 마리화나를 신성시하는, 언뜻 사이비처럼 들리는 이 종교가 왜 그의 음악을 이해하는 키(key)가 되는 것일까. 라스타파리교는 백인들의 제국주의로 박해받아온 아프리카인들의 해방을 꿈꾸며 그들을 격려한다. 사랑과 평화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이 종교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 사회변혁운동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착취와 불평등은 도처에 있다. 해방과 평화가 아프리카인들에게만 간절할 리 없다. 어느 누구도 핍박받지 않는 평화의 세계를 꿈꾸는 밥 말리의 메시지는 제국주의에 염증을 느끼는 유럽의 젊은 세대들과 반전을 외치는 미국의 히피들에게 강력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영화의 도입부와 엔딩에 소개된 두 개의 공연은 그의 신념과 메시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며 그가 단순한 팝스타가 아닌 용기 있는 아티스트임을 알게 해준다.
총선을 앞둔 자메이카는 양당 간의 대립이 극한에 치달아 위태로운 비상시국이었다. 그는 정치적 총기 테러를 당한 부상 속에서도 '스마일 자메이카 콘서트'(1976년)를 강행한다. 이후 망명해 안정된 출세 가도가 열렸음에도 밥 말리는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 '원러브 피스 콘서트'(1979년)를 통해 화합을 노래한다. 이때 양당 지도자를 무대로 불러내 손을 마주 잡게 한 장면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Everything's gonna be all right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알려진 'No Woman, No Cry'는 자메이카 국민들이 지난날의 슬픔을 딛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woman'은 고통받는 자들의 은유인 셈이다. '쿵짝쿵짝~'하는 리듬과 'Everything's gonna be all right'을 반복하는 밝은 가사 속에서도 어쩐지 마음이 짠해져 오는 슬픔의 이유일 것이다.
No Woman No Cry
밥 말리를 통해 음악이 가진 따뜻하고도 강인한 힘을 새삼 느낀다. 세상에 그리고 나에게 음악이 있어 참 다행이다.
※ 김효진은 팝 칼럼니스트 입니다. 아직도 안 망했냐는 말을 4년 가까이 들으며 잠실에서 LP 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시집 한 권과 여기저기 써낸 음악 에세이가 자꾸 늘어가는 무명작가이기도 합니다.




























![[강웅구 교수] 왜 죽은 권력자를 두려워할까? 이미지](http://img1.daumcdn.net/thumb/S232x160.q75/?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505%2F15%2Fthecolumnist%2F20250515050002340lgmk.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