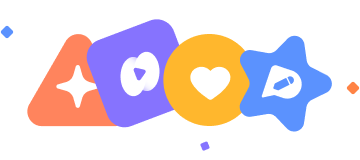자화상(Self Portrait)이라는 단어는 자아를 의미하는 ‘self’와 자의식을 그린다는 뜻의 ‘portray’가 합쳐진 것으로 자기를 ‘끄집어내다’, ‘밝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화상은 작가의 의식적, 무의식적 요소들이 풍부하게 포함된 이미지의 총체이며, 우리는 자화상을 통해 작가 자신만의 양식을 읽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화상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그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지, 희로애락 등의 감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눈은 사람의 내면을 나타내는 ‘마음의 창’이고 세상과 접촉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미술치료에서 눈을 생략한 것은 외부에 대한 회피와 거부를 상징한다. 반면 지나치게 눈을 강조하여 그렸다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민감하거나 의심이 많을 수 있다.
또한 눈을 감았거나 작게 표현했다면 내향적이거나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눈동자가 없는 텅빈 눈을 그렸다면 환경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거나 마음이 공허하다는 의미이다.

김선현 임상미술치료학회장은 지난 30여년간 트라우마 분야에 천착해 온 미술치료 전문가다. 세월호 참사 등 국내외 재난 현장에서 미술치료로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돌봐왔다. 저서 《자화상 내 마음을 그리다》(한길사 刊)는 그런 그가 엄선한 ‘세기의 거장’ 57명의 자화상 104점을 통해 ‘내 안에 숨겨진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스토리다. 화가들이 자화상에 남긴 흔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명화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화는 무엇일까? 정식라이센스를 맺고 특허복제기술로 복제명화를 제작해 국내에 공급하는 아이엠티아트(I.M.T.art)가 2009년 온라인 쇼핑몰, 서울시립미술관의 아트샵 등 국내 온·오프라인을 총망라 집계한 판매 순위를 보면, 1위는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가 그린 〈키스〉이다. 클림트의 〈키스〉는 전체 판매 그림 중에서 무려 17%를 차지했다.
2위에는 빈센트 반 고흐(1853~1890)의 〈해바라기〉가 올랐다. 역시 고흐의 저력은 대단하다. 2위에 이어 3위 역시도 반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 9위 〈별이 빛나는 밤〉 등 베스트10 중에 무려 3점이나 들어갔다.

고흐에 대한 전세계인의 사랑
그럼,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무엇일까? 2013년 구굴에서 2년 반에 걸쳐 진행한 명화 조사 프로젝트에 의하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 1위였다. 구글 아트 프로젝트는 뉴욕 현대미술관, 파리 오르세 미술관 등 세계 각 미술관의 대표 소장품들을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artsandculture.google.com)에서 볼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두 번째로 사랑받은 그림은 르네상스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1445~1510)의 〈비너스의 탄생〉. 바다 거품에서 태어난 비너스에게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입김을 불어 해변으로 밀어주고 있다. 3위는 렘브란트(1606~1669)가 42세 때 만든 판화 〈창문 앞의 자화상〉이다. 10점 중 넷이 반 고흐의 그림, 절반이 19세기 인상파 작품이다.

사무치는 고통을 아릅답게!
고흐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고통을 아름답게 승화했기 때문이다. 조현병, 가난, 우울과 불안, 알코올 의존증, 대인관계 부족 등의 문제를 수많은 작품을 통해 따뜻한 시선으로 솔직하게, 아름다운 색채로 찬란하게 표현했다.
렘브란트 이후 가장 위대한 네덜란드 화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대 미술사의 표현주의 흐름에 강한 영향을 주었던 고흐는 1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강렬한 색채, 거친 붓놀림, 뚜렷한 윤곽, 섬세한 형태를 통해 그 자신을 인상 깊게 전달했다.

사실 고흐가 감정적으로 늘 극단을 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쩌면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는지 모른다.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이름은 고흐보다 1년 먼저 태어나서 얼마 안 돼 죽은 형의 이름이니까. 그래서인지 그의 자화상은 죽은 형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자신을 형의 모습 또는 형보다 더 나은 인물로 대체하려는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파이프를 물고 귀에 붕대를 한 자화상〉에서 태연하게 파이프를 물고 있는 반 고흐는 불안, 고독, 불행과 싸우면서 자신이 아직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상징한다. 하나 더 추가하면 파이프는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무의식의 반영이라는 것이다.“언젠가 내 작품이 물감 값보다 가치 있을 때가 올 거야”라고 말했던 고흐, 고흐의 자화상을 보면서 고흐의 삶과 예술을 생각해본다.

사랑은 뒤늦게 깨닫는 감정
장 프랑수아 밀레(1814~1875)의 아내 오노의 운명을 누가 알았을까? 밀레의 첫 번째 아내인 오노는 가난으로 고생하다가 결혼 2년 만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내 폴린 오노의 초상〉은 오노가 사망한 바로 그해에 완성되었다. 그림 속 오노는 눈 주위가 어둡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다. 그럼에도 입술은 앙다물고 애써 눈에 힘주어 바라보는 모습은 피곤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는 듯하다. 입매는 양쪽 다 살짝 올라가서 입술을 앙다물고 미소를 지으려는 모습이다. 자신을 그리는 남편에게 미소를 주고 싶었던 걸까. 웃고 있지만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은 표정, 본인은 앞날이 많이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는지도 모른다.

이제 〈만종〉을 보자. 수확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림으로 널리 알려진 밀레의 대표작이다. 저물어가는 황혼 빛이 땅과 농부 부부를 비추고 있고,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는 듯하다. 그러나 부부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왜일까? 이 그림에 숨겨진 비화 중 하나는 바구니에 담긴 것이 원래는 씨감자가 아니라 죽은 아기였다는 것이다. 밀레는 처음에 죽은 아기를 그렸다가 친구의 권유로 씨감자로 바꿨다고 한다. 그들 부부에게는 큰 기쁨이었을 아기가 굶어 죽으면서 겪었을 슬픔은 저물어가는 빛의 색조와 그림자로도 다 대변하지 못할 것이다.

19세기 산업화 시대에 농촌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농부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던 밀레. 그의 그림에는 삶의 고단함과 인물에 대한 애정이 깊게 스며있다. 〈만종〉의 부부를 보고 있으면 밀레와 오노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 같다. 너무 사랑해서 미안하다는 말은 이들에게 꼭 맞는 것이겠다!
글 이규열(본지 발행인 겸 편집인)
[참고도서] 자화상 내 마음을 그리다 | 김선현 | 한길사
발행 에프앤 주식회사 MONEY PLUS
※2025년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대박! 빚까지 갚아준 10년 찐팬이랑 결혼한 연예인 누구?? [팬과 결혼 스토리] 이미지](http://img1.daumcdn.net/thumb/S704x312.q75/?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505%2F13%2F551837-hY4lfff%2F20250513090003926fvgw.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