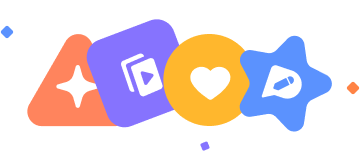흥국화재가 2000억원어치의 영구채 공모를 위해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목표 대비 절반 수준의 주문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추가로 투자자를 확보해 원하는 물량은 채웠지만, 보험사로서는 올해 첫 영구채 발행에 도전장을 냈다가 쓴잔을 마시게 된 모양새다.
보험사들이 자본성 증권으로 주로 활용하는 후순위채가 아닌 영구채를 통한 자금조달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흥국화재은 이번 달 2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30년 만기에 5년 후 콜옵션 조건이었고, 신용등급은 A-였다. 한국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을 맡았고, 교보증권과 흥국증권이 인수사로 참여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상환 만기가 아예 없거나, 혹은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당초와 동일 조건으로 상환을 무한정 미룰 수 있는 채권이다. 이처럼 상환을 계속 미룰 수 있는 채권이란 특성을 담아 통상 영구채로 불린다.
그런데 앞서 진행한 공모 수요예측에 주문이 1010억원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990억원이 미매각됐다. 이에 따른 경쟁률은 0.51대1에 그쳤다. 결국 최대 3000억원까지 열어 뒀던 한도는 채우지 못하고, 추가 청약을 통해 최초 희망 목표액만큼만 발행됐다.
수요예측 성적이 부진했던 탓에 발행 금리는 희망 범위 최상단에서 정해졌다. 희망 밴드를 5.80~6.10%로 제시했는데, 결국 발행 금리는 6.10%로 정해졌다.
흥국화재의 이번 회사채는 올해 들어 보험사가 처음으로 내놓은 영구채란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이전까지는 은행 계열사를 갖고 있는 금융지주들만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이들은 대부분 목표치 이상의 수요를 확인하며 영구채 발행에 성공했다. 올해 1월 첫 타자로 나섰던 KB금융만 0.92대1로 수요예측 경쟁률이 1을 밑돌았다. 신한금융은 2.48대1, DGB금융은 1.08대1, 하나금융은 2.59대1로 1을 웃돌았다. 이에 힘입어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처음에 공시한 2700억원보다 많은 4000억원으로 규모를 키워 영구채를 발행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자본성 증권으로 후순위채를 많이 이용한다. 올해 들어 흥국화재 이전까지 자본성 증권을 발행한 보험사들은 △한화손해보험(5000억원) △메리츠화재(3000억원) △DB생명(3000억원) △DB손해보험(8000억원) △흥국생명(2000억원) △KB손해보험(6000억원) △NH농협손해보험(2000억원) 등으로 모두 후순위채를 선택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수월한 자금조달만 가능하다면 영구채의 메리트가 크다. 자본성 증권은 만기가 긴 특성 덕에 본질은 채무임에도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다만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이라 시간이 갈수록 자본인정 비율이 낮아지지만,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으로 적용된다.
문제는 금리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후순위채보다 리스크가 큰 만큼, 영구채 발행 금리가 더 높게 책정된다. 결국 적정한 수준의 금리로 신종자본증권 수요를 확보하려면 발행 기업의 체격이 받쳐줘야 한다.
후순위채와 영구채를 둘러싼 보험업계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자본력 개선이 중요해지면서, 보험사들로서는 관련 증권 발행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보다 세밀한 저울질이 필요해진 상황"이라면서도 "보험사의 경우 웬만한 대형사가 아니면 아직 조건이 크게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지주사 곳간 점검] 포스코, 보릿고개도 끄떡없는 '잉여금' 이미지](http://img1.daumcdn.net/thumb/S308x208.q75/?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504%2F11%2Fbloter%2F20250411175416732xelo.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