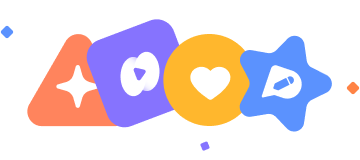고양이는 왜 그렇게 ‘아무 데서나’ 잘까?

고양이는 생물학적으로 ‘초식형 포식자’입니다. 말하자면 한 번에 긴 시간 잠을 자는 대신, 짧고 자주 잠을 자면서 체력을 보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묘 기준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12~16시간에 이르며, 때로는 20시간에 달하기도 하죠. 이는 야생 시절 짧고 반복적인 사냥과 도피를 반복하던 습성이 남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을 넘어 이해할 수 없는 자세와 장소에서 잠드는 고양이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고영희’ 씨. 아무 데서나, 아무 자세로, 갑자기 잠에 빠져드는 이 고양이의 수면 모습은 마치 하루 종일 야근한 직장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아무 데서나 ‘꿀잠’…고영희 씨의 기상천외한 수면 포즈

📍 사례 1: 회식 후 귀가한 대리님 자세
영희 씨는 소파 끝에 대충 털썩 주저앉은 채, 한쪽 다리를 들고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개는 가슴팍에 파묻힌 채 천천히 흔들리는데, 마치 늦은 밤 막차 안에서 졸고 있는 직장인의 모습과 완벽히 겹칩니다.
옆에서 누가 불러도, 문을 열어도, 꿈쩍도 하지 않죠. 세상과 단절된 듯한 집중력(?)입니다.
📍 사례 2: 말없이 술자리 빠져나온 인턴
빨래 바구니 안. 갓 개어놓은 수건 더미 위에 영희 씨가 기묘한 각도로 누워 있습니다.
두 앞발은 머리 위로 향하고, 뒷다리는 허공을 향해 벌어져 있는데… 이쯤 되면 고양이의 관절 구조에 의문이 생깁니다.
심지어 이 자세로 ‘코골이’까지. “누가 여기다 빨래를 널어놨어요?”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 사례 3: 회식 강요에 지친 사원
테이블 아래 어두운 구석, 혼자 웅크려 자고 있는 영희 씨. 주변 간식 냄새에 무심한 듯, 조용히 등을 돌리고 잠들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발 회식 좀 그만하자’고 중얼거릴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입꼬리가 살짝 내려간 채, 피곤에 절은 표정까지.
📍 사례 4: 감성 충만 눈물의 밤
창문 틈에 낀 채 구름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있는 영희 씨. 뺨에는 눈물 대신 콧물이 묻어 있고, 앞발은 가슴에 꼭 안겨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인생에 지친’ 듯한 포즈. “힘들어도 기죽지 말아요, 영희 씨. 당신 옆엔 제가 있어요…”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새가 도와달라고 했지만…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가장 황당한 장면은 단연 새와의 조우였습니다. 창밖에서 지켜보던 참새 한 마리가 영희 씨를 향해 ‘살려달라’는 눈빛을 보냈고, 영희 씨는 그 새를 바라보다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기이한 건, 그 새 역시 움직이지 않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것. 둘 사이에 무언가의 교감이 오간 걸까요?
이를 본 집사는 말합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하고 말았어요. 새에게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고양이의 수면, 웃기지만 중요한 건강 신호

이처럼 고양이의 기묘한 수면 자세는 웃음을 자아내지만, 한편으로는 건강 상태나 정서 안정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구불구불한 자세로 자는 건 관절 유연성과 근육 이완 상태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이며, 복부를 드러내거나 뒷다리를 편하게 뻗는 자세는 고양이가 환경에 대해 높은 신뢰를 느낄 때 나타납니다.
즉, 영희 씨의 다양한 포즈는 그녀가 얼마나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Copyright © animaltoc_off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