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1999년 '반도체 빅딜'은, LG그룹에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역사적 분기점이었습니다.
당시 정부 주도의 빅딜로 LG는 애지중지 키우던 'LG반도체'를 현대전자에 넘겨야 했습니다. 고 구본무 회장이 전경련에 발길을 끊었을 정도로, 이는 LG에게 굴욕이자 뼈아픈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만약'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만약 LG가 반도체 사업을 계속했다면, 지금의 SK하이닉스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품고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했을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닥친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그룹 전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까요?
1. 10조 원의 '죽음의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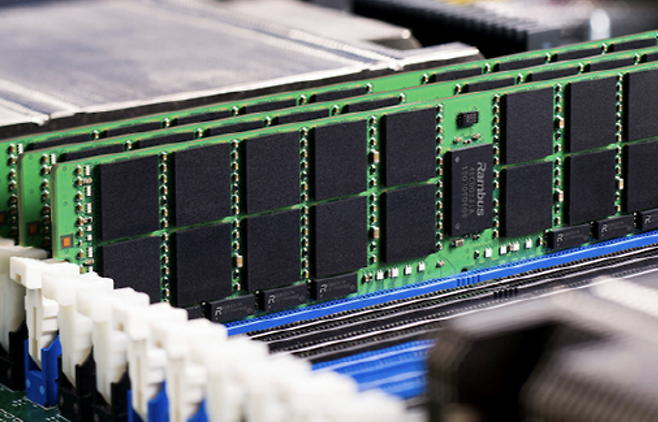
LG가 반도체를 포기한 직후, 시장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D램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1차 치킨게임'이 시작됐습니다.
1999년 20달러 수준이던 64Mb D램 가격은 2001년 3.8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합쳐진 '하이닉스'는 이 직격탄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하이닉스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무려 10조 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누적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일본의 엘피다, 미국의 마이크론 등 삼성전자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D램 업체가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만약 LG가 이 10조 원의 적자를 떠안았다면,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요? '하이 리스크'의 함정에 빠져, LG그룹 전체가 흔들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이유입니다.
2. 반도체 대신 얻은 '배터리 1위'와 '안정'

LG는 반도체라는 '하이 리스크'를 포기한 대가로 '안정'과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첫째, 2003년 국내 대기업 중 가장 먼저 '지주사 체제'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SK의 '소버린 사태'나 롯데의 '형제의 난' 같은 경영권 분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한 '신의 한 수'로 평가받습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졌습니다. 반도체에 쏟아부었을 수십조 원의 투자금을, 화학과 배터리 부문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CATL을 제치고 '글로벌 1위' 전기차 배터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3. '캐시카우' 부재라는 아킬레스건

하지만 이 안정적인 선택은, LG그룹에 '반도체 포트폴리오 부재'라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남겼습니다.
LG의 주력인 가전과 석유화학은 진입 장벽이 낮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독점한 D램 시장처럼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내지 못합니다. 이는 LG그룹이 삼성이나 SK보다 보수적인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고전한 이유 중 하나로 '반도체 부재'가 꼽힙니다. 2015년 퀄컴 '스냅드래곤810'의 발열 사태 당시, 삼성은 자체 AP '엑시노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LG전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스마트폰 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LG가 반도체를 계속했다고 해서 지금의 SK하이닉스가 되었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2011년, 모두가 '독이 든 성배'라며 외면했던 10조 적자의 하이닉스를 SK가 인수했고, 그 회사가 현재 400조 원을 넘보는 AI 시대의 '황금알'이 된 것을 보면, LG의 '합리적인 포기'는 더욱 뼈아픈 '놓쳐버린 기회'로 남게 되었습니다.
Copyright © 저작권법에 따라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배포, 전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