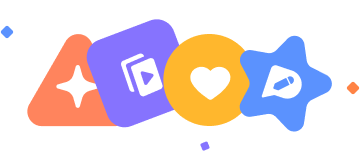‘오전 11시’, ‘인제 스피디움’. 현대자동차에서 흥미로운 초청장이 날아왔다. 스포츠카 취재는 아니다. 바로 신형 벨로스터 시승 행사다. 통상 시승 행사는 도심과 교외 도로에서 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런데, 서킷으로 기자들을 불렀다. 주행 성능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다. 아반떼 스포츠 오너로tj 신형 벨로스터의 장단점을 꼼꼼히 파헤쳤다.
벨로스터. 지난 2011년,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소형 해치백이다. 개성 강한 안팎 디자인과 2+1 도어, 센터 머플러 등 여느 식구들과 다른 독특함을 뽐냈다. i30, i40와 함께 P.Y.L(프리미엄. 유니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내세워 젊고 개성 있는 소비자를 유혹했지만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올해 신형 i30가 등장하면서 P.Y.L 브랜드는 사라졌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벨로스터의 경쟁력을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오늘 만난 모델은 약 7년 만에 돌아온 2세대. 공식 출시는 내년 1월 북미 국제오토쇼(디트로이트 모터쇼)다. 그 전에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미리 인사를 건넸다. 차체 크기와 엔진 출력 등 자세한 성능제원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트랙에서 벨로스터의 능력을 살필 수 있는 기회였다. 보안상 직접 사진은 찍을 수 없었다.
사실 1세대의 디자인은 내 취향과 거리가 멀었다. 둥글둥글한 얼굴과 빵빵한 엉덩이, 화려한 실내 등 지나치게 활기찬 느낌이었다. 그런데 신형은 한층 담백하다. 가령, 얼굴은 신형 i30, 아반떼 스포츠, 그랜저와 비슷한 표정으로 거듭났다. 눈매 안쪽에 각을 세워 날렵할 뿐 아니라 캐스캐이딩 그릴도 멋스럽게 어울린다.
신형 벨로스터의 이른바 ‘얼짱각도’는 뒤쪽에서 45°로 바라볼 때. 현대자동차 엔지니어에 따르면 구형보다 차체 높이를 낮추면서 더 넓고 안정감 있는 실루엣으로 거듭났다. 또한, 트렁크 쪽 창문과 테일램프를 여백 없이 붙이면서 단단한 이미지로 변했다. 램프 속은 쏘나타 뉴 라이즈와 비슷한 LED(발광다이오드)를 촘촘히 심었다.
속살도 한층 차분하다. 가령, 돌출형 모니터를 중심으로 좌우 비대칭 구조로 빚었다. 특히 센터페시아 오른쪽에 두툼한 면을 세워 운전자 중심의 공간을 꾸렸다. 재규어 F-타입이나 쉐보레 콜벳과 같은 스포츠카와 비슷한 구성이다. 또한, 구형보다 A필러의 위치를 뒤쪽으로 당겨 주변 시야도 한층 쾌적했다. 단, 소재 부분은 아쉽다. 대시보드와 도어트림에 모두 딱딱한 질감의 플라스틱을 입힌 까닭이다. 차라리, 푹신한 우레탄을 넣으면 어떨까?
뒷좌석은 구형처럼 도어가 오른쪽으로 한 개 있다. 그래서 운전석 쪽으로 볼 땐, 2도어 쿠페처럼 보이고, 동승석 쪽으로 볼 땐 5도어 해치백처럼 보인다. 오늘 행사에 자리한 현대자동차 연구원은 “운전할 때 가끔씩 내 차가 스포츠 쿠페 또는 편안한 세단, 해치백, SUV 등으로 변신하는 상상을 한다”면서 “벨로스터는 이러한 상상을 현실화시킨 독특한 자동차”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형 벨로스터는 구형보다 차체 높이가 낮지만, 의자를 절묘하게 빚어 머리 공간을 좀 더 확보했다. 그러나 여유로운 건 아니다. i30, 코나와 비교하면 조금 답답하다. 하지만 등받이 기울기가 적당해 착좌감은 만족스러운 편이다. 또한, 해치백 답게 트렁크 공간도 실용적이다. 바닥이 깊숙해 부피가 큰 짐도 싣기 수월해 보인다.
벨로스터의 보닛엔 두 개의 가솔린 심장이 들어간다. 직렬 4기통 1.4L 터보와 1.6L 터보 두 가지다. 리어 서스펜션은 모두 멀티링크를 물렸다. 또한, 하체 주요 부품을 알루미늄으로 빚어 무게는 줄이고 강성은 높였다. 간단한 제품 설명을 마치고 곧바로 서킷으로 향했다. 기자 1인 당 주어진 시간은 약 네 바퀴. 시승차는 1.6L 터보 모델이다.
먼저 동승석에 앉아 승차감과 움직임 특성을 체크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구형보다 시트 포지션을 낮추고 대시보드를 높여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느낌을 담았다”고 한다. 그러나 의자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동승석은 높낮이를 조절할 수도 없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탄다면, 머리 공간이 조금 답답할 수도 있다.
가장 흥미로운 건 가상 엔진 사운드. 1세대 벨로스터에도 있던 장치다. 센터페시아 모니터에서 다이내믹과 익스트림 등 모드를 선택하면, 스피커를 통해 엔진 사운드를 풍성하게 살찌우는 기능이다. 현대차 엔지니어는 “구형보다 자연스러운 소리를 구현하기 위해 영화 분노의 질주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질감은 있었지만, 운전 재미를 높이는 데 한 몫 거들었다.

이제 운전대를 잡을 차례. 전동 시트를 달았지만 여전히 시트 포지션은 높다. 아반떼 스포츠보다도 체감 상 높다. 또한, D컷 스티어링 휠을 넣지 않은 점도 아쉽다. 첫 번째 가이드 랩을 통과하고, 인제 스피디움의 긴 직선 주로에서 가속 페달을 깊숙이 밟았다. 매우 경쾌하다. 특히 저속에서 급가속 했을 때 발생하는 토크스티어 현상을 한층 억제해 만족스럽다.
주행 모드는 노멀과 스포츠, 에코 등 세 가지. 여기에 ‘스마트 시프트’라는 기능을 곁들였다. 운전자의 주행 성향을 실시간으로 학습해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모드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장비다. 짧은 서킷 주행 탓에 스포츠 모드에서 벨로스터의 잠재력을 파헤쳤다.
인제 스피디움은 고저차가 심하고 급격한 코너들이 즐비하다. 따라서 차체 비틀림 강성과 서스펜션, 변속기의 능력을 확인하는 덴 안성맞춤인 장소다. 현대차 연구원은 직접 아반떼 컵 레이스에 참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다듬고 완성도를 높였다고 한다. 그래서 고성능 타이어의 필요성도 느꼈다. 벨로스터 1.6 터보 모델에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 타이어를 신긴 이유다.
덕분에 네 바퀴를 든든하게 짓누르며 달리는 맛이 일품이었다. 아반떼 스포츠는 재미를 추구한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세단이 즐겨 신는 한국타이어 노블 2 타이어를 신겨 질타를 받았다. 또한, 아반떼 스포츠는 과격하게 코너를 공략할 때, 차체 뒷부분의 거동이 둔한 느낌이 있다. 반면, 벨로스터는 코너 바깥쪽으로 꽁무니를 살짝 흘리며 말끔하게 궤적을 그려낸다.
서킷 주행이 끝나고, 짐카나 코스를 타볼 수 있었다. 이번엔 7단 DCT 모델뿐 아니라 6단 수동변속기 모델도 준비했다. 변속기와 클러치의 질감을 확인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수동 버전은 다소 실망스러웠다. 먼저 클러치 페달의 답력이 지나치게 가볍다. 작은 힘으로도 ‘쑥~쑥’ 밟히는 덕분에 동력을 잇고 끊는 과정을 알아채기 힘들다.
또한, 기어레버의 위치가 아반떼 스포츠보다 소폭 뒤에 자리했다. 레버 앞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등을 집어 넣은 까닭이다. 또한, 팔 받침대의 위치도 뒤쪽에 어정쩡하게 자리했다. 그래서 기어를 조작하는 느낌이 아반떼 스포츠보다 부족했다. 클러치도 마찬가지. 출시 전까지 개선이 필요하다.
단순히 운전 재미만 치중한 차는 아니다. 가령, 앞쪽 그릴 엠블럼에 레이더 센서를 함께 심었다. 이를 통해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FCA)을 전 모델에 기본 사양으로 심었다. 또한, 차간 거리와 속도를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도 안전 장비로 챙겼다. 이외에도 후측방 충돌 경고 시스템(BCW), 차로 이탈방지 보조 시스템(LKA) 등도 빼놓지 않았다. 아쉽지만 해당 장비는 오늘 행사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벨로스터. 전담 부서를 꾸릴 정도로 곳곳에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났다. P.Y.L의 실패를 거울 삼아 마케팅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예컨대, ‘벨로박스’라고 부르는 이동식 전시장을 도심에 출현시켜 젊은 소비자와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아티스트와 협업해 벨로스터 아트카 등을 빚어 선보인다. 신형 벨로스터. 과연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2025 서울모빌리티쇼] 기아, PV5 국내 최초 공개 이미지](http://img1.daumcdn.net/thumb/S232x160.q75/?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504%2F03%2FROADTEST%2F20250403161706595ilwa.jpg)
![[2025 서울모빌리티쇼] 2세대 메르세데스-AMG GT 공개, 국내 출시는 5월 이미지](http://img1.daumcdn.net/thumb/S232x160.q75/?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news%2F202504%2F03%2FROADTEST%2F20250403163210906subq.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