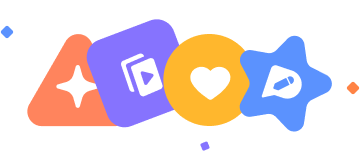지구와 해왕성 중간 크기의 외계행성 대기에서 이산화탄소가 검출됐다. 추산된 양은 금성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맞먹어 학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일본 국립천문대(NAOJ)와 미국 애리조나대학교 스튜어드천문대 공동 연구팀은 15일 관측 보고서를 내고 대기에서 이산화탄소가 검출된 외계행성 GJ 1214b를 소개했다. 2009년 발견된 이 외계행성은 물 및 수증기가 가득한 천체로 여겨져 왔다.
연구팀은 미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 등이 운용하는 차세대 심우주 관측 장비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이 축적한 GJ 1214b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기 조성에 주목했다.

NAOJ 특임연구원 오노 카즈마사는 “외계행성이 공전궤도를 따라 주성 앞을 지날 때 빛이 그 대기를 통과한다”며 “주성의 빛 중에서 어떤 파장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면 외계행성의 대기 조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GJ 1214b 같은 지구보다 크고 해왕성보다 작은 외계행성은 태양계 행성과 구조가 사뭇 다르다”며 “GJ 1214b는 암석으로 된 핵 주변에 수소가 풍부한 외층부를 가졌는지, 아니면 얼음 핵 주위에 수증기로 구성된 외층부를 둘렀는지 논쟁이 계속해 왔다”고 덧붙였다.
학자들이 떠올린 GJ 1214b의 두 가지 유형은 질량과 반지름 만으로는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대기를 관측하려 노력했다. 다만 외계행성 대부분의 대기는 두꺼운 구름에 덮여 지금까지 관측 장비로는 들여다보기 어려웠다.

오노 연구원은 “지구 크기의 약 3배, 질량은 약 8배인 외계행성 GJ 1214b를 제임스웹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하면 보다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다”며 “주성 GJ 1214에서 나오는 빛 파장별로 GJ 1214b 대기를 조사한 결과 이산화탄소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관측 데이터는 부정성이 다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많은 모델을 계산하고 관측치와 비교했다”며 “관측에 적합한 모델의 이산화탄소 양은 태양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포함한 금성의 대기와 비슷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이번 발견을 토대로 향후 GJ 1214b와 비슷한 외계행성을 집중 탐사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는 지구 외 생명체 존재 가능성과 연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은 2022년 최초로 외계행성(WASP-39b) 대기의 이산화탄소 관측에 성공했다.
정이안 기자 anglee@sputnik.kr
Copyright © SPUTNIK(스푸트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