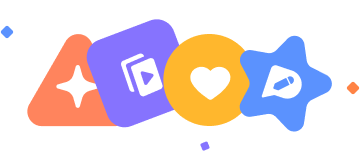대학교 4학년, 평소와 달리 청바지와 운동화 대신 빳빳하게 다려진 새 정장에 까만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섰다. 학교로 가는 길의 반대 방향, 버스를 타러 가는 발걸음에는 설렘 한 스푼 두려움 두 스푼이 더해졌다. 약 삼십 분 뒤 다다른 곳은 주택가 골목 사이에 위치한 초등학교였다. 모래 운동장 옆을 돌아 들어간 건물 안에서 머리 위로 보이는 팻말들을 유심히 살폈다. 저 멀리 ‘교무실’이 보이고, 어느 새 심장은 쿵쾅대고 있었다.
“ 안녕하세요? 사서 교사 실습생입니다.” 대학생이란 타이틀의 마지막 봄날은 사서교사라는 명찰을 바꿔 달고 학교에 첫 출근도장을 찍었다.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나는 당시 여러 개의 꿈을 갖고 있었다. 남들보다 돌고 돌아 스물두살에 시작한 대학생활은 조급함의 연속이었다. ‘무엇이든 빨리 해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 곳에 발을 걸쳤다. 교직이수도, 유학준비도 그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갑자기 기울어진 집안환경,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유학은 무산되었다. 다음은 취업이 일순위로 올라왔다. 급격히 추워진 취업 시장에서 바늘구멍 보다 더 좁아진 공무원의 길 보다 조금 더 열린 문인 취업의 길로 마음이 옮겨지고 있는 때였다.

하지만 취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긴 했지만 교생 실습은 궁금했다. ‘교사라는 직업을 경험하고 나랑 맞다면 임용 도전도 해볼까?’ 당시 현실에 맞춰 교사라는 어려운 길을 이순위로 미루긴 했지만, 초등학교 시절 “어른이 되면 무엇이 되고 싶나요?”라는 질문에 대답은 항상 ‘선생님’이었다. 누군가와 함께 쑥쑥 자라날 수 있는 직업인을 꿈꾸던 어린 지은이의 소망을 실습이라는 기간으로 채워주고 싶었다. “오느라 고생했죠? 교장 선생님께 인사하고 도서실로 갑시다.” 삽십대 후반? 사십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선생이 나를 맞이했고, 교생실습의 첫날이 시작되었다.
실습생은 나 말고도 두 명이 더 있었다. 우연이었는지 계획이었는지 재수 혹은 삼수를 거쳤던 나와 동갑인 다른 학교 친구들이었다. 그들과 한두마디를 나누다 보니 우리 셋 모두 다른 방향의 꿈도 있지만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공통점도 발견했다. 그렇게 설렘을 안은 채 학교 복도를 또각또각 소리내며 걸어갔고, 어느새 도서실의 문 앞에 도착했다. ‘ 학교 도서관은 알록달록 벽보가 붙어 있을까?’ 상상하는 순간 드르륵 나무 문이 열렸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가 상상한 이미지와 정반대였다. 교실 두 개 정도 만한 공간에 먼지는 가득했고 스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어 뭐지?’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귓가에 선생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느라 고생했죠? 오늘부터 한 달간 사서 실습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도서관 이동입니다.” 에? 무슨 말이지?
내일부터는 편한 옷을 입고 오세요.
구두 말고 운동화와 신고, 버려도 되는 청바지가 좋습니다.

그렇게 실습 둘째날은 오래된 운동화와 목이 늘어난 셔츠를 입고, 빨간 목장갑을 낀채 하루가 시작되었다. 마스크를 썼나? 안썼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뽀얀 먼지가 폴폴 날아다니는 우중충한 교실이었다. 그렇게 약 일주일, 매일 아침 칙칙한 야상이나 점퍼를 입고 학교에 출근을 했다. 사서 친구의 말을 빌려보면 교실 두 개 정도 공간의 도서실이면 약 만권 정도의 책이 있다고 한다. 책 한권의 평균 무게는 300g정도라 하는데, 실습생 세 명은 뽀얗게 먼지가 쌓인 3톤 정도의 무게를 나눠 날랐다.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어깨와 다리는 밤마다 아파왔다.
둘째주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양손에 책을 가득 들고 땀을 흘리며 책을 옮기고 있었다. 똑똑똑 도서관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학생 담당 교수입니다.”
내가 다닌 학교에서는 실습생이 잘 적응하는지 확인하고자 교수님이 학교를 방문하는 관례가 있었다. 교수님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왕눈이처럼 눈망울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때 나의 모습은 머리를 질끈 묶고 온몸에 먼지를 두른 일꾼 그 자체였다.
약 삼분 후, 교수님, 사서교사, 나 셋은 먼지 가득한 공간 어느 귀퉁이에 앉았다. 그리고 미묘한 톤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음… 교생 실습 기간인데, 이렇게 도서관 이동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교수님의 두 눈은 커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 다음 사서교사의 말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별거 아닌 일이고 실습은 꼭 시켜주겠다. 그리고 나는 이 지역에서 유명한 교사이다. 등의 말이 흘러나왔다. 어찌되었든 면담은 곧 끝났고 곧 퇴근 시간이 다가왔다.
다음날도 평소와 비슷한 마음으로 출근을 했다. ‘책만 옮기다 가면 되겠지?’ 하지만 그날부터 나의 지옥행은 시작되었다. 시작은 ‘꿈’이었다. 교생 실습을 한 첫째 주 교사는 나와 친구들에게 졸업하고 무엇이 하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나는 당시 사서교사 말고도 까만 수트를 입은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궁금했다. 그 꿈에 대해 말을 한 지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교사는 교수님이 떠나간 다음 날부터 나에게 “너는 절대로 컨설턴트가 될 수 없어!”라는 말을 랩처럼 읊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그녀의 눈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

밥 먹을 때는 누구도 안 건드린다는데, 점심시간 허기짐을 달래려 밥을 한 숟갈 뜨려는 순간에도 그 교사는 “너는 안돼”라는 말과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아 댔다. 나는 밥을 제대로 씹을 수도, 삼킬 수도 없었다. 스피커를 틀어 놓은 것처럼 하루에 수십 번 같은 말을 듣는 이주일이 흘러갔다. 검은 기운이 가득 담긴 말을 하루 종일 그것도 매일 듣다 보니 온 몸에 “넌 안돼”라는 말이 온몸에 스며 버렸다.
어느 새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겨워졌다. 하지만 ‘교사 자격증’이라는 종이 한 장을 받기 위해서 매일 무거운 발걸음을 끌며 출근을 해야 했다. 그래도 막상 교실 문 앞에 다다르면 약간의 기운이 올라왔다.
오늘도 같이 잘 버텨보자. 힘내!!
축 쳐진 어깨를 안고 출근을 하는 나에게 동료 실습생들은 약속이나 한듯 힘이 나는 말들을 건네 주었다. 이 덕분에 기나긴 하루를 까만 먹물이 아닌 우중충한 잿빛 정도의 기분으로 흘려 보낼 수 있었다.
그나마 실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한 조각의 기억상자를 열어보면, 마지막 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교육 두 시간 정도이다. 하지만 동료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만 기억날 뿐 내가 무엇을 준비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 속에 흔적조차 없다. 교생 실습 마지막날, 어느 새 교생 삼총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 절대로 학교에서는 만나지 말자”라는 말을 하며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그리고 얼마 뒤 우리는 모두 취직에 성공해 교사와 멀어지는 약속을 착실히 지켰다.
“넌 안돼”라는 검은 목소리가 몸에서 빠져나갈 즈음부터, ‘사서교사’라는 직업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 만약 실습생 세명이 없었다면 도서관 이사는 어떻게 할까, 혼자서 다?’ 상상만 해도 아찔했다. 학교 도서관은 사서교사 한명이 전체를 관리하거나 도서부 학생들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만권이나 되는 책을 교사 한 명이서 옮긴다? 다시 생각해 보니 '이동'이라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또한 도서관의 책들은 책장에 그냥 꽂히는 것이 아니라 분류 번호 규칙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아르바이트 생이 온다고 해도 ' 도서 분류법(도서 분류법은 주제에 따라 도서 물품을 정리하고 부호화한 뒤 이를 구분하는 번호를 할당하는 체계)'교육이 꼭 필요하다. 교사 한 사람이 3톤 분량의 책을 옮겨야 하는 타이밍에 교생 실습생만큼 최적의 일꾼은 없었을 것이다. 내가 '노동'이라는 단어에 무게를 두어버려 잊고 있던 사실 속에는 많은 책들을 주제에 맞게 분류하고, 번호에 맞추어 하나씩 정리하는 작업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거기에 더해 '대출과 반납', 가끔 '교욱' 서비스 까지 포괄해야 하는 '사서 교사' 라는사람이 있었다.
‘체계적인 교직실습 프로그램만 있었다면 직업이 달라졌을까?' 다른 학교에서 실습을 받은 친구들 중에는 좋은 추억들을 가득 안고 돌아와 진짜 사서교사가 된 이들도 있다. 가끔 생각해 보지만 그때는 환경과, 상황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버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어도 씁쓸한 기억으로 남겨 졌을 것 같다. 그래도 지금까지 나에게 한 가지 남겨진 점이 있다. 어느 도서관에 가서도 원하는 책이 있는지 헤메지 않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몸에 남겨진 습관인가 보다.
“넌 안돼”라는 말과 먼지 가득한 곳에서 일한 기억 때문에 ‘사서교사’라는 직업과는 멀어졌지만 적어도 하나 남은 것 하나는 있다. 나를 제대로 겪어 보지도 않고 나라는 존재와, 가치를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 혹은 환경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다시 고려해 보기로 말이다. 또한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에게 말을 건넨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어차피 다른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어
그렇게 나의 사회인으로서 시간은 졸업을 하기 전 스르륵 다가왔다.
* 지은이
* 서른 일곱의 호기심쟁이 입니다. ‘직업(業)’을 넘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존재와 싸운 기억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은 ‘스타트업 코파운더(co-founder), 상담심리사, 학생’을 병행하며, 순간의 감정을 글로 풀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뉴스레터 <세상의 모든 문화>에서 '부캐의 발견'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글은 뉴스레터 <세상의 모든 문화>에 연재되고 있는 글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총 20여명의 작가들이 매일(주중)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뉴스레터로,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무료 레터 콘텐츠입니다.
Copyright © 해당 글의 저작권은 '세상의 모든 문화' 필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