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 멜로디', 소설가 조해진이 그린 '확장된 선의와 연대'의 이야기 [책과 세상]
단편 ‘빛의 호위’ 등장인물 연대의 확장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던 주위의 빛을 포착한 찰나가 노래처럼 온 사방에 흘러서 영원이 되기까지. 소설가 조해진의 새 장편소설 ‘빛과 멜로디’는 그가 7년 전 내놓은 단편소설 ‘빛의 호위’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로의 환원이자 마침내 완성한 순환의 고리다.
대화도 거의 나눠보지 않은 같은 반 반장 ‘승준’이 아버지에게서 훔친 필름 카메라를 받아서 쓰다 분쟁지역 사진작가가 된 ‘권은’. 권은은 시리아 난민캠프에서 포탄에 왼쪽 다리의 절반을 잃었다. “그러니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반장, 네가 준 카메라가 날 이미 살린 적이 있다는 걸 너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 ‘빛의 호위’에서 이렇게 말하던 권은의 애틋한 마음을 기억하는 독자들에게 '빛과 멜로디'는 위로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열렬한 선의와 연대의 빛이 지난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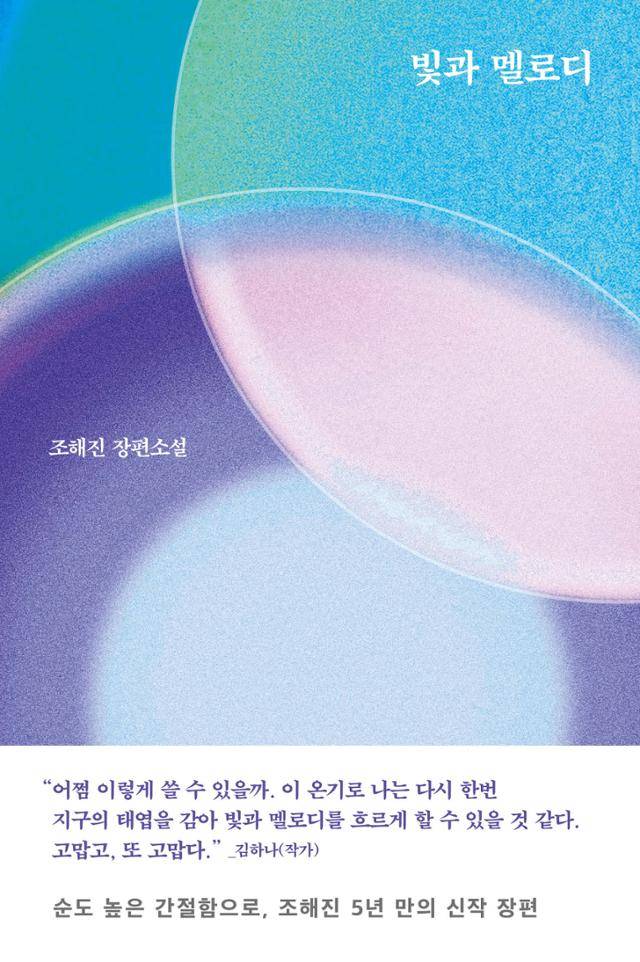
‘빛과 멜로디’는 선의, 연대, 소통의 순간이 빛처럼 지나간 자리를 비춘다. 권은은 승준과 7년이나 연락이 끊긴 채 영국에 머무르고 있다. 잡지사 기자인 승준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 임신부와 인터뷰를 하기로 한다. 얼마 전 딸 ‘지유’를 낳은 승준의 아내 ‘민영’은 “갓 태어난 아이를 돌봐야 하는 동안만큼은” 좋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싶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듣기를 거부한다.
권은과 승준의 ‘연결’의 순간은 기어코 다시 찾아온다. ‘빛의 호위’에서 권은이 승준에게 편지를 썼던 블로그를 통해서다. 우크라이나 임신부와 인터뷰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며 ‘권은이라면’이라고 가정했던 승준은 지유가 세상에 온 순간부터 권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이번엔 승준이 권은에게 편지를 쓴다. “그런 친구가 자신에게 있었다고, 카메라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빛을 쫓던 친구가 있었다고 말이다.”
그늘에서만 포착되는 장면들

그늘에는 씁쓸함과 고독만 존재할 것 같지만 그늘에서만 보이는 장면이 있다. 빛은 유난히 올곧거나 강인한 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서다. “아직 꿈꾸는 미래가 있고 계산하지 않는 순수가 있는 그런 세계에서 자신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왔다”고 여기는 승준의 아내 민영. 그는 권은을, 또 권은은 영국의 분쟁지역 사진가인 ‘게리 앤더슨’을 닿을 수 없는 존재로 인지하지만 그들 역시 끊임없이 회의했다. 권은은 사고 이후 여러 가능성을 계산하며 누군가를 원망했고, 게리도 마찬가지다. “숱하게 찍어온 사진들이 과연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의미 있는 말을 걸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는 없었다.
흔들리고 의심하고 망설이면서도 내보인 손짓들은 연약할지라도 타자 간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빛과 멜로디처럼 퍼져 나간다고 조 작가의 소설은 말한다. 부모 없이 온기 없는 방에 틀어박힌 열세 살의 권은이 굶어 죽을까 봐 돈이 될 만한 카메라를 훔쳐다 준 승준의 손짓으로부터 시작된 연대는 홀로코스트 현장과 전쟁이 벌어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으로 배경을 넓혀나간다. 권은과의 인연으로 영국인 ‘애나’의 도움을 받아 영국에 정착한 난민 ‘살마’는 이런 확장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승준이 인터뷰한 우크라이나 임신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를 영국으로 초청하기로 결심한 살마는 “너는 그들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잖아”라는 권은의 우려에 답한다. “은, 잊었어? 애나도 내 이름만 듣고 나를 초대했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폭력과 전쟁이 계속된다. ‘빛의 호위’가 쓰일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쟁들이 새로이 시작됐고, 탈레반 정권이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삶은 뒷걸음질 쳤다. 타자가 더 이상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아닌 부담이 된 현실에서는 “앞으로 더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고 그럴듯할지도 모른다. 소외라는 문학의 본령을 꾸준히 파고드는 조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말했다. "(이런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누군가는 비웃을지라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다시, 믿고 싶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권은에게 증여된 카메라가 이 세상의 본질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급대 앱 '진료 가능' 떠도 병원에선 '불가능'… 틀린 정보가 뺑뺑이 더 돌린다 | 한국일보
- 33년 전 하와이 발칵 뒤집은 여대생 살인 사건… 진범은 재수사 직후 자살했다 | 한국일보
- '백신 부작용 호소' 악동클럽 이태근 사망... 향년 41세 | 한국일보
- 김재중 父 "폐암 완치 판정, 아들 덕분에 살았다" ('편스토랑') | 한국일보
- 유치원 남교사가 6세 명치 때리고 목 졸라...피해 아동 "마음 뚫리는 것 같아" | 한국일보
- 카라큘라, 쯔양에 "너무나 억울해" 옥중 편지…6일 첫 재판 | 한국일보
- 김민아 아나운서, 뒤늦게 전해진 이혼 소식 "성격 차이 때문" | 한국일보
- 홍명보호, 불안한 출발...'약체' 팔레스타인에 0-0 충격의 무승부 | 한국일보
- "나라 망신"... 튀르키예서 2200만원 든 가방 훔친 한국인들 | 한국일보
- 오늘 '디올백' 분기점 될 중요 이벤트... 역대 수심위 67%가 검찰과 다른 결론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