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일언] 팔만대장경에 담긴 소원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원 대상을 하나쯤은 갖고 있다. 선사시대에도 사람들은 해나 달에 소원을 빌거나 거대한 바위나 동굴 벽에 원하는 것을 새기거나 오래된 나무에 기원했다. 종교가 생겨나면서부터는 신앙의 대상에 의지해 소원을 빌고 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자 사람들은 그들의 소원을 불상에 직접 새기거나 종이나 비단에 써서 불상 안에 넣었다. 1400여 년 전 부여에 살았던 정지원이라는 인물은 금동불상을 만들면서 먼저 죽은 아내가 좋은 곳에 이르기를 기원했다. 신라의 고위 관직을 지냈던 김지성은 재산을 다 털어 돌아간 부모와 아내의 명복을 비는 데서 더 나아가 국왕과 그 일족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경주 감산사에 석조 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을 만들었다. 그가 719년에 불상을 만들면서 불상 뒷면에 새겨놓은 발원문은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고려 시대 사람들의 간절한 발원은 팔만대장경이나 불상의 복장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국가의 위기를 부처의 힘으로 물리치고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고 가족의 안녕과 내세를 위해 불상을 조성했다. 창녕 군부인 장씨는 1346년에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을 만들 때, 참여자 천여 명의 한 사람으로서 발원했다. ‘다음 생에는 정토에서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중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남자의 몸을 내려 줄 것’을 구체적으로 기원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했던 조선 시대에도 극락왕생, 무병장수, 자손 번영 등을 바라는 왕실 발원 불상이 많이 제작됐다. 이런 애절한 발원도 있다. 400여 년 전에 안동에 살았던 원이 엄마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며 슬픔을 담아 한글로 편지를 썼다. 이승에서의 너무나 짧은 인연의 아쉬움이 저승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라고 꿈속에서나마 간절히 만나기를 염원했다. 이 편지와 자신의 머리카락을 엮어 만든 미투리가 1998년에 무덤을 이장하면서 발견됐다. 요즈음은 곳곳의 ‘소원 나무’와 남산의 ‘소망 열쇠’ 같은 곳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이 시대를 사는 너와 나,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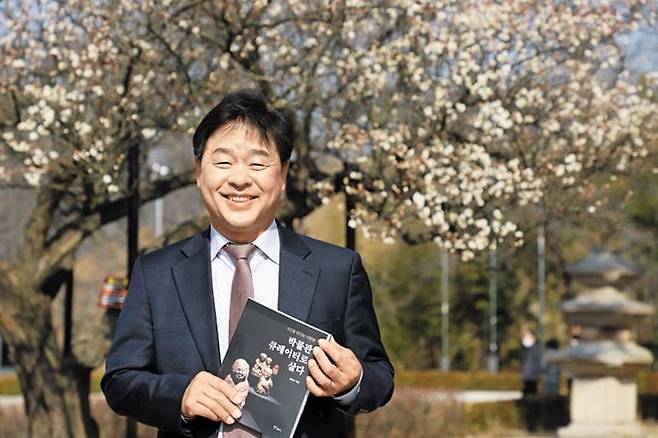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ditorial: Parenthood desires in South Korea rise, sparking hopes of reversing birthrate decline
- South Korea, U.S., and Japan pledge tight coordination on FX market dynamics
- 이재명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 안 당해”…'박영선 총리설’ 겨냥?
- 尹대통령, 4·19 혁명 기념 조조참배... 총선 후 첫 외부일정
- 성장 이어가는 넷플릭스...올 1분기 가입자수 2억 6960만 명
- '챗봇 전쟁'에 나서는 메타...챗GPT 대항할 '메타 AI', 소셜미디어에 탑재
- 구글, '이스라엘에 클라우드 제공 반대' 시위 가담자 28명 해고
- “샤넬백 200만원 싸대”…전세계 명품 쇼핑족 몰려간다는 ‘이 나라’
- “팬 갑질 아니냐” 슈주 려욱, 악플러에 일침
- [C컷] 어느날 찾아온 장애... 이들의 두번째 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