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한일간 차이를 인정하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역시 유서 깊은 렌가테이(煉瓦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므라이스를 놓고 무릎을 맞댄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양국 정상의 다정한 만남만으로 양국 사이의 무거운 기억을 쉽게 떨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씨(氏)의 용법이다.
미래의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수많은 오해의 벽을 하나하나 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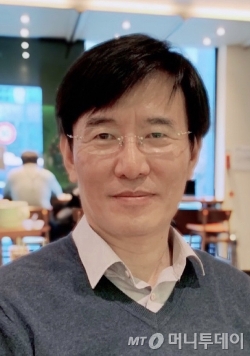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역시 유서 깊은 렌가테이(煉瓦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므라이스를 놓고 무릎을 맞댄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양국 정상의 다정한 만남만으로 양국 사이의 무거운 기억을 쉽게 떨칠 수는 없을 것이다. 새 한일관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겉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은 너무 비슷하다. 사람들의 생김새가 비슷하고 언어의 문법과 어휘도 비슷하다. 19세기 중반 이전까진 한반도 언어가 일본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 이후엔 일본어가 한국어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물론 최근에는 또다시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 새뮤얼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서 일본을 한국, 중국과 다른 별개의 문명으로 분류했는데 맞는 이야기다. 일본은 동아시아대륙에서 명멸해온 '제국'의 '세례'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20세기에 그들이 만든 소위 '일본제국'은 제국이 아닌 제국주의에 불과했다. 반면 한반도는 몽골제국에서 고려 왕가가 몽골 황가와 혈연으로 엮이기도 했고 조선 건국자 일부는 몽골 지방관리 출신이기도 했다. 명(明)과는 책봉관계로 긴밀히 연결됐고 호란(胡亂)에서 패한 후 청(淸) 제국의 판도에 들어가기도 했다. 나쁘게 보면 주권을 훼손당한 것이고 좋게 보면 다민족 '제국'을 경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제국의 경험유무가 양국의 세계관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다. 니체가 '선악을 넘어서'라는 책을 통해 로마제국에서 가톨릭제국으로 이어지는 '제국'이 유럽인들에게 '착함'을 심어놨는데 이 '착함' 집착이 진정한 자유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니체의 정치사상을 '제국 비판'으로 읽을 수 있다.
제국과 접촉이 많았던 한반도 주민은 '착함'으로 세상을 보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그렇지 않았던 일본 주민들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는다. 한국인의 눈에는 일본인이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타인의 아픔에 둔감해 보이기도 할 것이다. 반대로 일본인의 눈에는 한국인이 너무 예민해보일 것이다.
오해는 세계관뿐만 아니라 일상언어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씨(氏)의 용법이다. 우리와 달리 일본에서는 '씨'를 아주 높은 사람에게만 쓴다. 그래서 한국 언론이 일본 보도를 옮길 때 '~씨'라고 직역하면 한국 독자들은 불쾌해진다. 이런 경우 한자를 그대로 옮길 것이 아니라 한국식으로 '~대통령'처럼 직책을 적어야 오해가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예가 '쿠야시이'(くやしい)다. 보통 '분하다'라고 번역하는데 '애석하다, 속상하다'는 뜻도 있다. 예전에 김연아에게 아사다 마오가 패했을 때 이 말을 했는데 한국 언론이 일제히 '분하다'고 번역해 한국 독자들이 "자기가 져놓고 뭐가 분해"라고 어이 없어 한 적이 있다. 이는 전적으로 오역에서 나온 오해다. 미래의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수많은 오해의 벽을 하나하나 넘어야 할 것이다. 우린 겉모습만 비슷할 뿐 서로 너무나 다른 외국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동규 (국제시사문예지 PADO 편집장)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임창정이 먼저 접촉, 서하얀은 갑질"…작전세력 폭로 글, 진실은 - 머니투데이
- 父 서세원 떠나보낸 서동주, 또 비보…6년 함께한 반려견과도 작별 - 머니투데이
- 서세원 빈소 찾아온 채권자 "돈 갚는다고 한지 2년"…소동 빚을 뻔 - 머니투데이
- 김구라子 그리, 비트코인 대박…"수익률 800%, 이득 많이 봐" - 머니투데이
- 6남매 둔 '고딩엄마', 누워만 있다 외출…친정母 독박육아 '충격' - 머니투데이
- 120달러 넘보더니…국제유가 80달러대 뚝, 트럼프 "전쟁 마무리 단계" - 머니투데이
- 코스닥 액티브 ETF 2종 출격, 시장 활력 불어넣을까 - 머니투데이
- 1200만 앞둔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 제기…제작사는 부인 - 머니투데이
- 장나라 소속사 관계자, 숨진채 발견…현장에 유서 남겨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이란전 며칠 내 끝날 수도...원유 공급 차단 땐 더 강하게 타격"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