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나의 시네마 에세이 <76> 사랑과 영혼] 사후 세계 믿을까…살아있을 때 ‘더 사랑하고 살라’는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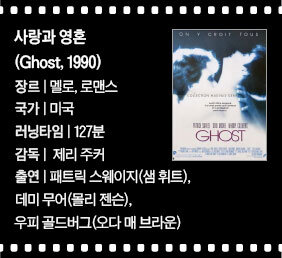
죽으면 어떻게 될까? 육신을 떠난 영혼들의 세계가 있을까? 몸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아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이를까? 살아생전 착하게 살면 죽어서라도 상을 받고, 나쁜 짓 하면 저승에 가서 벌을 받을까? 혹시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승에 미련이 남아 떠도는 영혼이 있는 것은 아닐까?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샘의 인생은 그런대로 성공적이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도 있고, 사랑하는 몰리도 있고, 슬픔과 기쁨을 나눌 친구 칼도 있다. 완전한 삶은 없다지만 이만하면 괜찮은 편이다. 그래서일까. 샘은 오히려 불안을 느낀다. 이 행운이 정말 내 것일까.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으면 어쩌지.
입 밖에 소리 내어 ‘나는 행복하다,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불행한 사람이 듣고 시기할 수도 있고, 행운의 신이 더 이상 복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샘도 그런 말을 들었을까. 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걸 알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조차 하지 못한다. 그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동감(ditto)’이라고만 답한다.
“난 항상 좋은 일이 생기면 놓칠까 봐 겁이 나.” 샘은 솔직히 말한다. 불안은 쉽게 전염된다. 몰리는 사랑하는 샘의 어깨를 안아줄 수 있을 뿐, 어떻게 안심시켜야 할지 모른다. 무언가의 시작은 무언가의 끝이 된다. 빛 다음엔 어둠이 온다. 행복한 순간, 불행을 예감하는 건 지혜이거나 생존 본능이다.
불안은 엉뚱한 데서 실체를 드러낸다. 샘이 맡고 있는 계좌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와 있었다. 컴퓨터 고장이 아니라면 누군가 고의로 입금한 것일 테고, 그런 돈이라면 정상적인 거래일 리 없다. 샘은 일단 비밀번호를 바꾼다. ‘내일은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일이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건 아니었다.
퇴근 후 몰리와 연극을 보고 돌아오는 길, 샘은 강도를 만난다. 지갑을 빼앗으려는 남자와 몰리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샘의 몸싸움이 격렬해진 순간 터진 한 발의 총성. 몰리는 비명을 지르고 샘은 달아나는 강도를 쫓는다. 괴한이 사라진 골목 끝에서 샘은 가쁜 숨을 몰아쉰다.
몰리는 피투성이가 되어 울부짖고 있었다. 그녀 품에 안긴 건 총에 맞아 쓰러진 샘, 자신이었다. 그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난 여기 있는데, 저 남자는 누구지? 몰리,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그는 죽었다. 한 번도 인생이 이토록 허무하게 끝날 거라고 상상한 적 없었다. 한순간에 사라진 생명, 아니 순식간에 육체가 없는 유령이 되다니. 죽어서도 마음은 남아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니. 하지만 몸이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못 했는데.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고 인정받은 것일까. 하늘에서 내려온 하얀빛이 샘을 감싼다. 그는 빛을 따라가야 한다고 느낀다. “샘, 나를 두고 가지 마.” 하지만 몰리가 그의 몸을 안고 울고 있다. 그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사이, 빛의 길이 닫힌다.
죽은 다음에도 의식이 남아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더 클까,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살아갈 사람에 대한 부러움이 더 클까? 나의 부재를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될까? 몰리는 슬픔에 빠져 있다. 샘은 그녀에게 말을 건네지만 몰리는 듣지 못한다. 그녀의 손을 잡는데도 몰리는 느끼지 못한다. 비로소 샘은 자신이 죽었다는 걸 실감한다.
몰리가 집을 비운 사이, 괴한이 침입한다. 샘은 그가 자신에게 총을 쏜 강도라는 걸 알고 경악한다. 집을 뒤지던 그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샘은 괴한을 뒤쫓는다. 지하철을 타고 집까지 따라간 샘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다. 샘은 우연히 죽은 게 아니었다. 그의 죽음은 어떤 목적을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었다. 그 뒤엔 그토록 믿었던 친구, 칼이 있었다.
샘은 칼이 마약 업자들을 위해 돈세탁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 그의 계좌를 이용했다는 것, 그가 바꿔놓은 비밀번호를 얻기 위해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칼은 비밀번호를 손에 넣을 때까지 몰리에게 접근, 샘의 수첩을 찾으려 할 터였다. 몰리가 위험하다. 그러나 샘은 유령이다. 목소리가 없으니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육체가 없으니 나쁜 놈을 때려줄 수도 없다.
영혼만 남아 이승에 남는다면 당연하다고 믿었던 상식과 습관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일 것이다. 가령 손잡이를 돌려야 문을 열 수 있다는 생각, 벽이 있으니 그 너머로는 갈 수 없다는 고정관념, 몸이 없는데도 달려오는 지하철에 치이면 고통스럽게 죽을 거라는 공포. 죽음이란 생전의 습성과 관념을 버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샘은 우연히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어설픈 영매, 오다 매를 만나 도움을 청한다. 괴한을 따라갈 때 만났던 지하철 유령을 찾아가 몸이 없어도 물질을 이용하는 방법도 배운다. 그가 말한다. “집중해. 너의 분노, 너의 사랑을 뱃속에 꾹꾹 밀어 넣고 핵폭탄처럼 터뜨려.”
살아 있을 때 그렇게 집중하고 몰입하며 살아야 했다. 샘은 화가 날 때 길바닥에 구르는 깡통 하나 차볼 생각도 해본 적 없었다. 그는 살아서는 품어보지 못한 용기와 오기와 사랑을 안고 몰리를 지키기 위해 달려간다.
‘사랑과 영혼’은 1990년 제리 주커 감독의 작품으로 원제는 ‘유령(Ghost)’이다. 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미 무어가 생사를 넘어 사랑하는 연인을 연기했다. 주제가 ‘Unchained Melody’와 함께 도자기를 빚던 몰리와 샘의 사랑스러운 모습도, 우피 골드버그의 오다 매도 기억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몸이 있을 때 더 겸손하게, 부끄러움 없이, 더 열심히 살며 아낌없이 사랑하고 싶게 만드는 영화다. 그런데 사후 세계를 믿을까 말까? 죽음으로 끝이라면 아쉬움도 보람도 느낄 수 없을 테니 남은 건 두 가지다. 검은 사자에게 끌려가며 나쁜 짓 하지 말 걸 하고 후회하거나, 하얀빛에 감싸여 착하게 살아온 자기에게 고마워하는 것. 어느 쪽이 안정적인 투자일까?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 김규나
조선일보·부산일보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 소설 ‘트러스트미’ 저자
Copyright © 이코노미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