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이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 강성민의 문화 이면 ◆

책과 이야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모든 책은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허구든 사실이든 졸가리를 지어 썰을 풀면 이야기인 것이다. 이야기 중에서 가장 큰 이야기가 뭘까? 내가 알기론 빅뱅이다. 우주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에서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갑자기 팽창해 생겨났다는 이야기다. 아 과학자 선생님들! 이걸 믿으라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건 관찰과 추론에 근거하고 증거도 있다. 물론 그 증거의 증거력은 입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빅뱅은 매혹적이다. 그건 이 우주가 사실은 물리적 실재라기보다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나의 상상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우주가 이야기라고? 실재가 없다고? 슈뢰딩거의 고양이나 양자 얽힘 같은 현상을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고 만져진다고 해서 그것이 있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지구에 있는 입자의 성질이 바뀌면 그것과 쌍인 안드로메다에 있는 입자도 성질이 바뀐다는 게 양자 얽힘이다. 실험으로도 증명이 됐다. 빅뱅보단 훨씬 믿을 만하다. 하지만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입자는 그 먼 거리를 사이에 두고 어떤 물리적 연결 상태를 가지고 있을까. 수수께끼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다. 만약 그 둘이 연결돼 있다면, 순간 이동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이다. 우주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된다.

아무튼 빅뱅 이론이 이야기라면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이야기의 바깥은 없다. 이 세계의 본질이 이야기인 것이다. 역사도 과학도 모두 이야기다. 사실 한국어 '이야기'만큼 이런 본질에 충실한 단어도 없다. 중국어로 이야기는 구스(古事)다. 일본어는 모노가타리(物語)다. 이 둘은 시간성과 물질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말 이야기는 그런 게 없고 텅 비어 경계가 없다. 그래서 상상력을 펼치기가 적합하다.
요즘 나는 이야기에 대한 명상에 빠져 있다. 특히 옛날 기담류를 뒤적거리는 취미가 생겨서 그쪽 세계에 푹 빠져 있다 보니 갑자기 이야기란 뭘까 하는 마음이 생겨버렸다. 지난 세월 이야기를 찾아다니며 이야기로 먹고살다 보니 이야기에 푹 젖어서 내가 이야기인지, 이야기가 나인지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매직아이처럼 갑자기 이야기가 바닥에서 공중 부양해 나의 뇌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왔다. 그래, 책은 이야기인데 왜 나는 이야기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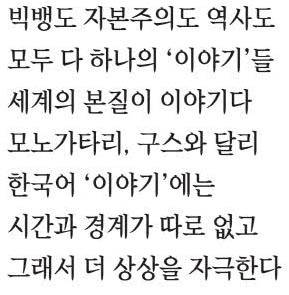
우리는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고민한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옳은지'를 생각한다. 그리고 재밌을까, 웃길까, 적절할까를 많이 생각한다. 하지만 이야기 자체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왜 사람들은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할까. 마치 유전자에 새긴 것처럼,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것처럼 이야기에 고파할까. 왜 웹툰과 웹소설 시장은 갈수록 확장되면서 이야기를 지어내려고 아우성인가. 어떻게 보면 힘든 현실을 잠시 잊고 드라마에 푹 빠져 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런 얘기로 충분할까. 이야기엔 좀 더 필연적인 존재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빅뱅까지 호출해서 이야기 명상을 해보았더니 우선 드는 생각이 있었다. 이야기의 바깥도 없고, 세상이 모두 이야기투성이라면 사실 우리가 이야기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우주라는 큰 세계, 지구라는 작은 행성,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아주 작은 플롯 속에서 이리저리 짜맞추어지는 이야기들. 하지만 큰 기계 속의 부품으로 그치지 않고, 빅뱅의 대폭발처럼 모래알 같은 우리도 하나의 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희망. 그런 게 이야기의 진정한 매력은 아닐까.
사실, 최근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운 시리즈를 하나 기획 중이다. 이야기에 대한 명상이 끝도 없는 도돌이표를 그리며 원 안에 갇혀 있으니 갑갑증이 들어 그걸 물리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 끝에 기획한 것이다. 이름하여 '기담(奇談)' 시리즈. 말은 기담이지만 귀신이 곡할 기이한 이야기만을 담자는 건 아니다. 자신이 이야기임을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 이야기의 존재감이 살아 있는 이야기. 어쩌면 무척 지난한 선별 과정과 탐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야기 찾아 삼만리를 하는 기획이다. 과연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고 함께 손잡고 머나먼 곳을 향해 떠나게 해줄 그런 이야기가.
[강성민 글항아리 대표]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그래도 잘 갚더라”...연 18% 대출받는 가정주부들 - 매일경제
- [속보] 기니만서 해적에 억류...한인 탑승 급유선 하루 만에 풀려나 - 매일경제
- 골 넣고 ‘호우 세리머니’로 도발 가나 선수…호날두 표정보니 - 매일경제
- 영화 ‘브로커’처럼...교회 베이비박스에 아기 두고 간 20대女 형량은? - 매일경제
- [단독] 문체부,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규제혁신 광고 중단
- “한국 9번 누구?” 꽃미남 조규성 인스타 폭발...4만→26만 - 매일경제
- “우루과이 무승부” 또 적중…英 족집게 말대로 한국 16강 갈까 - 매일경제
- ‘9.9억→7.7억’ 노원 대장 아파트도 수억씩 뚝…노도강, 고금리 직격탄에 흔들 - 매일경제
- SK 치어리더 ‘코트를 뜨겁게 달군 핫걸들’ [MK화보] - MK스포츠
- 강예슬, 잘록한 허리라인 “보고만 있어도 심쿵”[똑똑SNS]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