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국정은 민원(民願) 청취나 민원(民怨) 해결 그 이상이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 의해 수정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 고충 상담을 대통령실서 해야 하나
큰 그림 그려야할 국정이 사소한 민원 해결에 매몰돼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 민원실은 따라오지 않았다. 따라서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청원서나 탄원서를 어디에 접수해야 할지 몰라 여기저기 헤매는 국민이 많이 생겨났다. 옛날 청와대에는 ‘연풍문’이라는 민원인 안내 시설이 있었다. 새 대통령에게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싶어 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 탓에 ‘용산 대통령실’은 엊그제 새로운 소통 창구로서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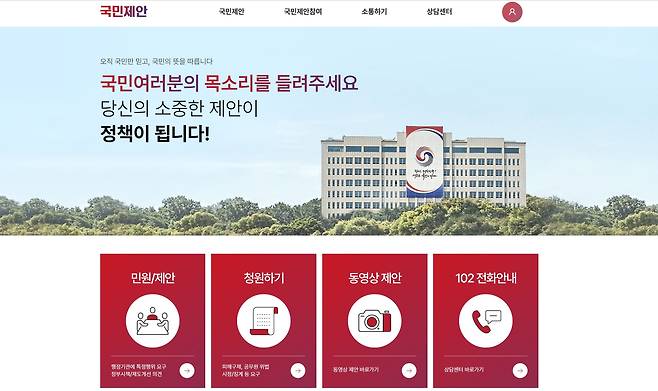
국가 지도자와 일반 국민이 서로 소통하는 일은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의 표상이다.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어떤 희망 사항을 청원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운영한 ‘국민청원’ 제도에는 문제가 많았다. 특히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의 경우가 그랬다. 문재인 정부는 그것이 접근성과 신속성에 있어서 소통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자평(自評)했지만, 실상은 크게 달랐다.
5년 동안 누적 방문자가 5억명을 넘었던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에는 하루 평균 600건 정도의 글이 올라왔는데, 대부분은 정제되지 않은 분노와 검증되지 않은 호소였다. 국민청원이 아니라 국민 애원에 가까운 것이 더 많았고 국가적 주요 의제 또한 여론 재판에 희생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른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관련하여 유난히 의욕이 넘쳤다. 청와대는 민원 청취의 주역을 자임했을 뿐 아니라 공론장의 역할까지 자청하고 나섰다.
“함께해준 국민 덕분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퇴임 전날 허언(虛言)과 더불어 국민소통 게시판 자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전(前) 정부의 ‘국민청원’이 새 정부의 ‘국민제안’으로 나름 명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이 어쨌든 필요하다고 느끼는 저변의 국민 정서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듯하다. 우리나라에서 피지배자의 목소리가 최고 권력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전통은 조선시대 신문고(申聞鼓)에서 비롯되었다.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이 ‘현대판 신문고’로 불린 것도 그런 연유다. 신문고는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가령 중국의 자금성이나 일본의 에도성 앞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도였다.
문제는 이런 ‘직소(直訴) 정치’의 의미와 역기능이다. ‘국뽕’ 역사학자들은 이를 두고 민의상달(民意上達)이라 미화하지만, 1401년 태종이 창덕궁 앞에 큰 북을 내걸 때는 역성혁명과 왕자의 난이라는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반란 음모를 포착하려는 목적이 중요했다. 또한 세조가 “부모나 수령이 괴롭히는 일이 있으면 즉시 와서 나에게 고하라”고 말했을 때, 신문고는 ‘자애로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영·정조대에는 신문고가 장소나 형식, 신분을 불문하고 만백성이 국왕 면전에 탄원할 수 있던 또 다른 소통 장치, 곧 ‘상언(上言)’ 및 ‘격쟁’\(擊錚)’과 병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조선의 정치는 지극히 사소화(些少化)되었다. 나라 전체를 위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국정이 민원(民怨)과 민정(民情)에 매몰된 탓이다. 직접 참여의 일상화에 따른 ‘정치 과잉’ 사회의 도래 또한 예고된 결말이었다. 좋은 정치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요순(堯舜)시대의 미담이 최소한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전통사회의 유산이 현대 민주주의와 결합하여 모든 사회적 갈등과 정쟁이 오직 최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끌리고 쏠리고 들끓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고질적 정치 문화다. ‘제왕적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윤석열 시대가 ‘일하는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려면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대한 지나친 부담과 강박에서 벗어나길 권한다. 국민 소통 방식의 개선은 물론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민의(民意)나 민원과 관련된 창구를 대통령실에서 계속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국민 ’고충’, 국민 ’권익’, 국민 ’참여’ 담당 조직은 정부 내에 이미 차고 넘친다. 맞상대가 대통령인 직접 소통의 남용과 과열은 자칫 민심을 괴물로 만들기 쉽다. 그리고 그 괴물은 나라를 망치기도 한다. 신문고 스타일의 전근대적 직소 정치가 유일한 혹은 최상의 국민 소통은 아닐 것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설] 尹·李 첫 회동, 정례화만 합의해도 성과
- [사설] 선거 참패 책임 親尹이 또 당 장악한다면
- [사설]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 추진국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들
- [朝鮮칼럼] 국회의원에게 금배지 대신 점퍼를
- [기고] 惡意를 가진 AI 통제, 한국의 틈새시장 될 수 있다
- [그 영화 어때] 나를 괴롭히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홍상수 신작 ‘여행자의 필요’
- [특파원 리포트] 교육부 파견 공무원의 어떤 언행
- [문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詩] [17] 공연
- 배민, 넥슨, 그리고 하이브 [여기 힙해]
- [기고] 힘든 토끼 위한 ‘따뜻한 보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