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스타 U2는 왜 뉴욕타임스 기고를 거절당했나

뉴욕타임스 편집장의 글을 잘 쓰는 법|트리시 홀 지음|신솔잎 옮김|더퀘스트|288쪽|1만6000원

어떻게 쓰지 않을 수 있겠어요|이윤주 지음|위즈덤하우스|240쪽|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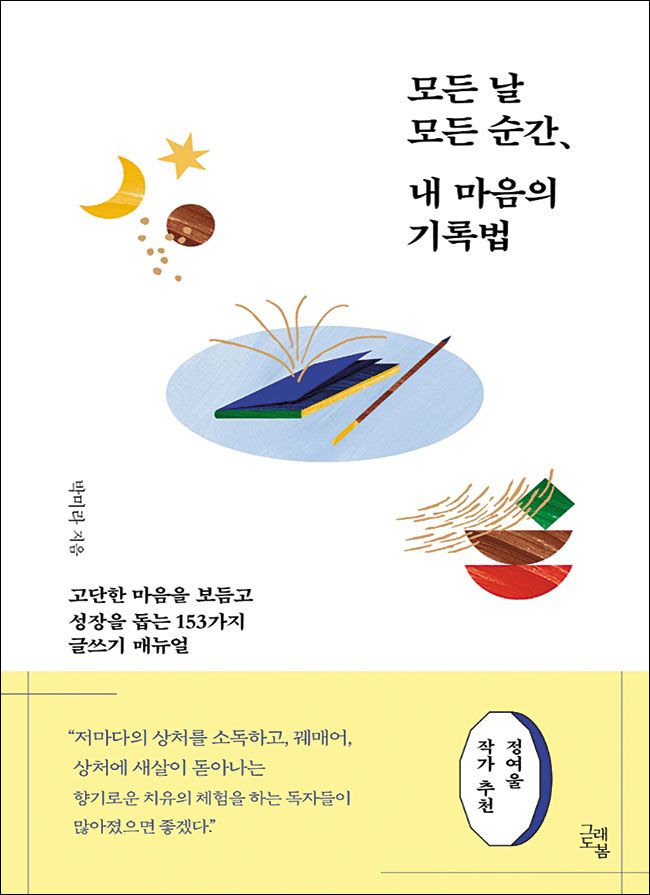
모든 날 모든 순간, 내 마음의 기록법|박미라 지음|그래도봄|324쪽|1만5800원
책 읽는 사람은 줄어도 글쓰기 책은 잘나간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올해 1~9월 글쓰기 관련 도서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6% 늘었다. 김현정 교보문고 베스트셀러담당은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글쓰기를 통해 ‘나’를 드러낼 일이 많아지면서 글쓰기 책 판매도 덩달아 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주만 해도 글쓰기 팁을 일러주는 책이 여러 권 나왔다.
“수많은 유명인과 성공한 사람들이 쓴 형편없는 글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길이 없었다. 아이비리그 학교의 말쑥한 졸업생들이 쓴 글은 복잡한 문장과 시시한 아이디어가 가득했다. 마땅히 주목받아야 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전문 용어에 갇혀 독자에게 닿지 못했다.”
트리시 홀 전(前) 뉴욕타임스 외부 칼럼 총괄 에디터는 ‘뉴욕타임스편집장의 글을 잘 쓰는 법’에서 이렇게 말한다. 홀은 2011~2015년 문인, 교수, 정치가,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사람들이 뉴욕타임스 여론면 ‘Op-Ed(Opposite Editorial)’에 기고한 글을 매주 수백 건 검토하고 다듬었다. “유명인사들은 자신들이 아무 말이나 해도 신문에 게재될 거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다. 이름이 무엇이든, 배경이 어떻든 간에 글에는 반드시 요점이 있어야 하고 그 요점이나 주장이 새로워야 한다.” 제3세계 구호활동가이기도 한 U2의 리드보컬 보노가 보내온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원고를 홀은 거절했는데, 뜬구름 잡듯 모호하고 현실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며, 장황했기 때문이다. “간결한 글과 따분한 글은 다르다. 간결함이란 의식적으로 단어를 선별하고 문장 구조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자가 이해하려고 지나치게 노력할 필요 없이 욕조에 몸을 담그듯 문장에 빠져들도록 몇 번이고 글을 살피고 검토해야 한다. 마찰이 느껴지지 않는 글이 되도록 말이다.”

이 책의 원제는 ‘설득하는 글쓰기(Writing to Persuade)’. 여러 팁 중 홀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고유한 ‘스토리’다. 그는 “글에는 당신만의 경험과 감정이 담겨 있어야 한다”면서 “수많은 유명인이 (신문에) 글을 싣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써야 한다’는 형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로 전하듯 글을 쓸 때 자신만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다. 사실만 나열하거나 ‘전문가’처럼 글을 쓴다면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는다.”
홀은 글에 진정성을 부여하고 싶다면 “자신을 드러내라”고 조언한다. 많은 필자들이 세부적인 이야기보다 보편적인 이야기를 더욱 많이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필자의 이야기가 글의 중심이 될 때 영향력과 설득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기명 칼럼도 대체로 지극히 사적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글이었다. 유방절제수술 경험을 털어놓으며 여성들에게 유방암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촉구한 앤젤리나 졸리, 말기암 진단을 받은 후의 삶에 대해 쓴 신경의학자 올리버 색스 등이 대표적인 예다. “지극히 사적인 내용을 더할 때 스토리가 더욱 강력해진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별 볼일 없는 하찮은 이야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쑥스럽더라도, 또는 인터넷상에서 악플이 달릴 걱정이 들어도 그렇게 해야 한다. 당연히 온갖 말들이 달리겠거니 생각하고, 가능하면 댓글을 읽지 않는 게 이롭다.”
많이 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 전문용어를 쓰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게 하면 기계가 하는 말처럼 들린다. 홀은 “간결하고 구체적이면서도, 어려운 전문용어가 없는 글을 쓰고 싶다면 자신의 글과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한다”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릿속에 다른 글이나 생각이 밀고 들어오기 전에 전날 쓴 글을 들여다보면 새롭게 보인다”고 말한다.
자신을 드러내되 결국 독자라는 타인이 감당하게 될 ‘자아의 체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미묘한 문제. “자신의 글과 거리를 두라”는 말은 많은 글쓰기 책에 담긴 조언이다. 국어교사, 신문기자를 거쳐 출판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이윤주씨도 글쓰기를 통해 마음의 균형을 잡는 법을 이야기하는 ‘어떻게 쓰지 않을 수 있겠어요’에 적었다. “독자와의 거리를 왜곡하지 않는 정도의 자아가 필요하다. 자아가 없는 글은 글이 아니다. 하지만 비만한 자아에 깔린 글은 부끄럽다.”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치유를 위해 쓰는 사람들도 있다. 치유하는 글쓰기 실습서 ‘모든 날 모든 순간, 내 마음의 기록법’을 낸 심리상담가 박미라씨는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쓰다 보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된다”고 말한다. 원망과 분노로 마음이 괴로울 땐, ‘죽도록 미운 당신’에게 편지를 쓰며 제 마음을 들여다보라고도 권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E&A, 3조4000억원 규모 해외 화공플랜트 수주... 최근 매출액 2.5% 이상
- 카카오·KT·네이버·삼성전자 ‘폭파 협박’ 10대, 결국 구속
- 딥시크, V4 사전 접근권 中 반도체 기업에 몰빵...‘엔비디아 칩 사용’ 의혹 의식했나
- 롯데·현대면세점, 인천공항 DF1·2 면세사업자로 선정돼
- [단독] 상설특검, 25일 대검 압수수색...‘무혐의 회의’ 규명 차원
- ‘총선 편향 방송’ MBC 뉴스하이킥 중징계, 항소심도 위법 판단
- 주택임대사업자 겨눈 정부… “꼼수 인상, 집값 담합 잡겠다”
- ‘코스피 6000 파티′ 욕망의 감옥에서 살아남을 3가지 생존 전략
- 과천에 아주대병원 들어선다...종합의료시설 건립 협약
- 107일간의 태양광 공급 과잉 대응… 봄철 전력망 시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