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윤 교수 "찌아찌아족 한글 도입 때 한 국가적 약속, 하나도 안 지켜"
국내 동남아 박사 학위 1호… “신남방 정책도 이런 식이면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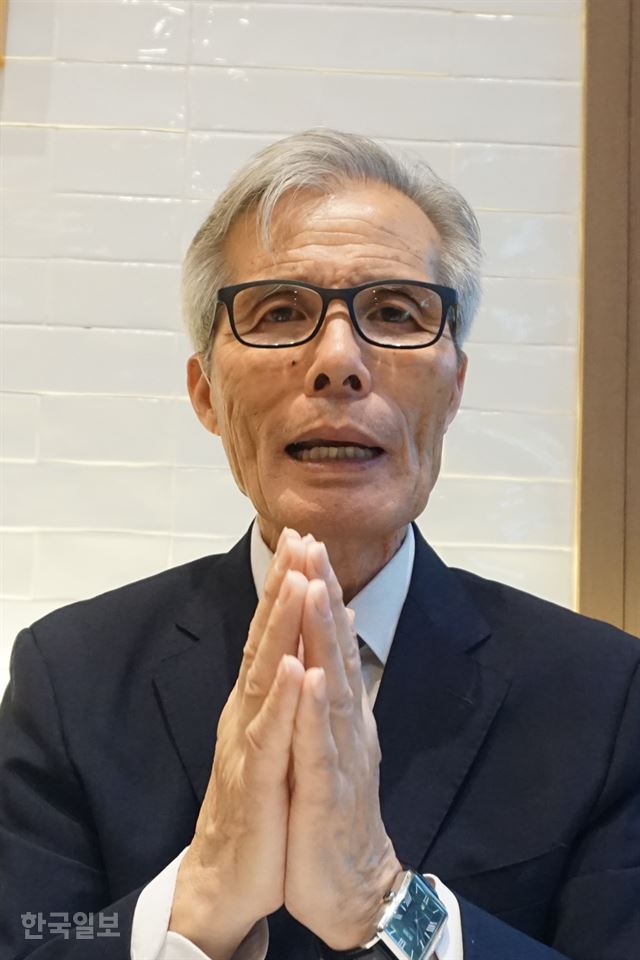
“우리는 고관대작 불러서 꽹과리 치고 사진 찍으면 끝이에요. 뭐든 다 해 줄 것처럼 약속하고 정작 지키질 않아요. 한글의 세계화로 포장한 찌아찌아족 사례가 대표적이죠. 신(新)남방 정책도 그런 식이면 곤란해요. 당장의 이익에 집착하면 안돼요. 인도네시아는 마음으로 중요한 나라입니다.”
노(老)교수의 일침은 정곡을 찔렀다. 후끈 달아올랐다 이내 식는 냄비근성, 겉으로 치켜세우고 속으로 깔보는 뒤틀린 우월의식, 다양한 가치를 돈으로 치환하는 배금주의 같은 고질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를 바라보는 우리네 시선에 여전히 담겨있다. 신남방 정책에 편승한 행사가 인도네시아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열리지만 알맹이는 보이지 않는다. 인도네시아가 왜 중요하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해서 일 게다.
반세기 가까이 아세안을 연구하고 체험하고 부대끼면서 족적을 남긴 국내 동남아 박사 학위 1호 양승윤(73) 한국외대 명예교수에게 답을 구했다. 최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바쁜 일정을 소화한 양 교수를 출국 4시간 전까지 붙잡아 뒀다. 내용은 세밀했고 주장은 명징했다.
-찌아찌아족은 성공 사례 아닌가.
“2009년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받아들였다고 한글의 세계화로 포장하며 얼마나 떠들었나.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나서서 팔만대장경을 복사해 준다, 문화원 건립해 준다 등 국가적인 약속을 했는데 하나도 안 지켰다. 오히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인도네시아어는 인도네시아 공식 문자로 표기한다는 포고령을 내려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일종의 경고다. 일본은 학급(클래스) 수준,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지원한다. 우리는 약속만 거창하고 사진 찍고 돌아서면 끝이다. 작은 약속부터 신중하게 그리고 꼭 지켜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터놓고 답답한 마음을 나눌 우방이다. 오래 전부터 그랬다. 10ㆍ26 사태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남매가 피신한 곳도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이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 ‘포스트 4강 외교’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에 함포를 발사해 폭파시키는 힘을 가진 나라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조력자이기도 하다. 남북한에 모두 대사를 파견할 뿐 아니라 한반도특명전권대사가 따로 있는 유일한 나라다. 자원, 시장성, 노동력을 갖춘데다가 태평양과 인도양 가운데 버티고 있어 경제적,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다.”
-무엇을 해야 하나.
“국제 관계에서 정치는 속된 말로 술 마시면 끝이고, 더 기여하는 경제는 사업이 종료되면 끝이다. 친구는 끝까지 친구다. 4강 이후 시대 우리 후세들을 위한 자리로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여 역할을 주고 인도네시아가 채우도록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엔 대단한 녀석(젊은이)들이 많다. 서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대도 확대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 한국학을 심는 일이 거기에 속한다.”
-인도네시아의 한국학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학과가 있는 대학은 4개, 강의하는 대학은 12개다. 한국학과가 수십 개(현재 22개) 있는 베트남에 비해 적다. 1997년 족자카르타 가자마자대에서 한국어 강좌가 시작됐다. 최고 명문인 국립인도네시아대(UI)에 한국학과가 생긴 이듬해(2007년) 1,048명이 지원해 28명을 뽑았다. 그 해 성적이 가장 좋은 학과였다. 전임교수도 없고 학과장은 중국어과 교수인 신생 학과에 인재들이 몰린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33명이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 명은 국가 지도자 40인 명단에 올라가 있다.” 양 교수는 인도네시아에 한국학을 처음 심은 선구자로 현재도 노구를 이끌고 양국을 오가며 강의한다.

-정부가 주목할 부분은 없나.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을 들여오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칼리만탄섬과 술라웨시섬 사이, 발리와 롬복 사이를 잇는 신(新)대양항로 준비라고 보면 된다. 이곳은 해적이 준동하는 말라카해협의 대안 항로로 기능할 것이다. 우리가 그 주변 동갈라 등지에 국책 사업으로 조선소를 짓는다면 선점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외 자원 개발에 수십 조원을 붓는데, 저런 걸 연구해야 한다.
한가지 더, 인도네시아의 한국학 도약을 위해 한자 경제 등으로 학문 분야를 넓힐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개방대학의 7개 해외 캠퍼스 중 출석률이 가장 좋은 곳이 한국(95%)인 점을 감안해, 장소라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양 교수는 인생의 길잡이 두 명을 소개했다. 의대에 진학하려다 실패하고 1966년 한국외대 마인어과에 입학한 뒤 공개 강좌에서 만난 고 이한빈 박사(경제부총리 역임)는 20대 약관의 시야를 넓혀 줬다. “‘4강에만 매달리면 갈 곳이 없다. 50년 뒤 가장 강대국은 인도네시아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박혔고, 그 분이 말한 시점이 2020년인데 초강대국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비중 있는 국가가 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는 불혹의 양 교수가 더 멀리 가도록 길을 열어 줬다. 한 교수 권유로 1990년부터 10년 가까이 아세안순회세미나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때 양 교수를 북돋운 한 교수의 덕담은 지금도 울림이 있다. “열심히 해 보라, (아세안에) 길이 있고 빛이 있고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다.”
자카르타=고찬유 특파원 jutda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