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출산 인식을 바꾼 문학, 모옌의 ‘개구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옌은 우리나라 독자가 모두 아는 작가는 아니다.
그러나 모옌은 영화로 제작돼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은 '붉은 수수밭'으로 세계적 작가로 부상했으며 중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대작가다.
모옌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 3년 전인 2009년에 그때까지 30년 동안 중국에서 금기시됐던 계획생육 문제를 용감하게 비판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2009년 '개구리'가 출간되자 중국인들은 자녀 출산에 관한 생각을 바꿔 다자녀를 둔 사람들을 더 이상 비웃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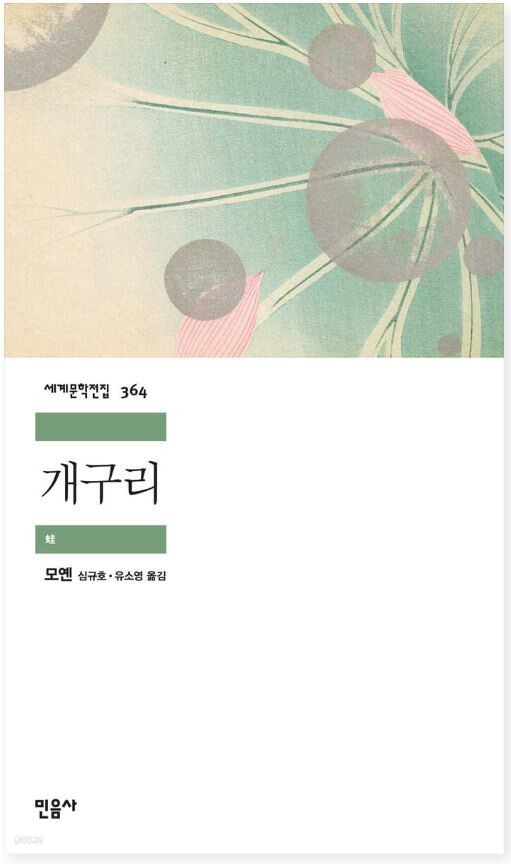
모옌은 우리나라 독자가 모두 아는 작가는 아니다. 그러나 모옌은 영화로 제작돼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은 ‘붉은 수수밭’으로 세계적 작가로 부상했으며 중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대작가다. 모옌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 3년 전인 2009년에 그때까지 30년 동안 중국에서 금기시됐던 계획생육 문제를 용감하게 비판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타고난 이야기꾼 모옌이 무려 10년에 걸쳐 구상하고 4년에 걸쳐 쓴 작품이 바로 ‘개구리’다.
본인만의 독특한 소설 언어를 구축한 작가인 모옌은 ‘개구리’의 한 글자 한 문장을 숙고하며 완성했다. 우리나라 독자들은 ‘개구리’라는 제목으로는 소설의 주제나 내용을 짐작할 수 없겠지만, 중국인들은 제목만으로 충분히 이 소설이 중국의 계획생육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개구리를 뜻하는 ‘와’(蛙)가 중국어로 아기를 의미하는 ‘와’(娃)와 음이 같아서 제목만 보고도 이 소설이 개구리가 아닌 아이에 관한 소설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1960년 이후 여러 아시아 국가는 중국처럼 ‘다산은 빈곤의 원인’이라는 맬서스의 인구론에 기초한 산아 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국가가 자녀 계획은 당사자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홍보와 유인책을 통해 산아 제한을 펼친 데 반해, 유독 중국은 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국가가 쥐고 마을과 직장 단위로 할당제를 시행했다.

이 소설의 화자인 커도우는 아내와의 사이에 딸 하나를 뒀다. 아내는 남편에게 아들을 안겨주고 싶어서 갖은 노력 끝에 몰래 둘째를 임신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군인이었던 커도우는 둘째를 가질 수 없는 국가 시책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처지였다. 조카 며느리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산아 정책 고위관리인 고모는 트랙터를 몰고 와 중절 수술을 받지 않는 조카며느리 친정집을 부수기 시작한다. 친정집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침내 커도우의 아내는 고모의 뜻에 따라 수술대에 오른다. 그러나 과다 출혈로 죽고 만다. 창백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모습은 많은 독자에게 큰 슬픔과 애절함을 던졌다.
‘개구리’는 문학적인 의미를 떠나 중국 사회에서 출산 관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1990년 초 코미디 단막극 ‘초과 출산 유격대’가 방영됐을 때 대부분 중국 시청자는 산아 제한 관리의 감시를 피해 이곳저곳으로 도망치면서 기어코 셋째 자식을 낳으려고 시도하는 극 중 농민 부부를 비웃었다. 그러나 2009년 ‘개구리’가 출간되자 중국인들은 자녀 출산에 관한 생각을 바꿔 다자녀를 둔 사람들을 더 이상 비웃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부모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게 됐다. 모옌은 구체적이고 세밀한 묘사를 통해 독자들의 시각, 청각, 후각을 자극하며 마치 독자들이 소설 속 현장에 있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한다.
박균호 교사 ‘나의 첫 고전 읽기 수업’ 저자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 총선 다음날로 미룬 ‘56조 세수펑크’ 결산…법정시한 처음 넘긴다
- 선거 이틀 앞두고…윤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속도 확 높이겠다”
- 김부겸 중도 공략, 임종석·박용진 가세…민주 ‘원팀 유세’
- 한동훈 “야권 200석 되면 이재명·조국 ‘셀프 사면’ 할 것”
- 이재명 “투표용지가 옐로카드”…서울·인천 접전지 찾아 심판 호소
- [단독] 전공의 파업에 직원 ‘희망퇴직’…서울아산병원이 처음
- 7살 쌍둥이 키우던 무용수 엄마, 4명 살리고 하늘로
- “당직자가 ‘윤 영상’ 제작” 보도에…조국혁신당 “정치공작” 반발
- 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한 적도 계획도 없다”
- ‘박정훈 항명죄’ 군사재판, 이종섭 ‘직권남용’ 수사 물꼬 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