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수 없어 머물고 머물 수 없어 간다 [한주를 여는 시]
이승하의 ‘내가 읽은 이 시를’
문무학 시인의 왜가리
한 곳에만 머물 수는 없나
왜가리 습성으로 풀어낸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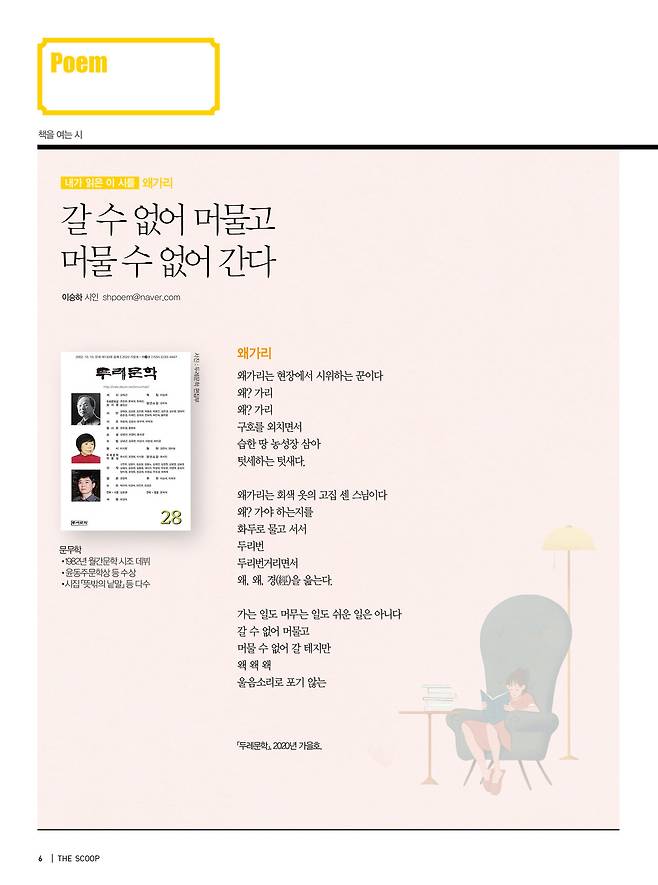
왜가리
왜가리는 현장에서 시위하는 꾼이다
왜? 가리
왜? 가리
구호를 외치면서
습한 땅 농성장 삼아
텃세하는 텃새다.
왜가리는 회색 옷의 고집 센 스님이다
왜? 가야 하는지를
화두로 물고 서서
두리번
두리번거리면서
왜, 왜, 경(經)을 읊는다.
가는 일도 머무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다
갈 수 없어 머물고
머물 수 없어 갈 테지만
왝 왝 왝
울음소리로 포기 않는
「두레문학」, 2020년 가을호.
![시인은 왜가리의 생태를 이용해 질문을 던진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thescoop1/20240401082323633ijlj.jpg)
문무학 시인의 우리말 실험은 정말 재미있다. 외래어 공세에, 아이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준말 유행에, 국적 불명의 신조어 탄생에 우리말이 비틀거리고 있는 요즈음 문무학 시인의 말놀이는 단순한 언어유희가 아니라 집현전 학자들의 공부처럼 진지하다.
우리나라에 흔히 볼 수 있는 백로과의 새 왜가리는 "왝~왝" 하고 울어서 왜가리라는 이름이 붙었을 것이다. 정수리와 목, 가슴과 배는 희고, 등은 청회색인데 다리와 부리가 길어 아주 기품이 있다. 시인은 왜가리가 철새가 아닌 텃새인 것에 주목했고, 어디 멀리 가지 않는 생태를 이용해 한편의 시조를 썼다. 왜가리를 가끔 보면 거미줄을 치고 기다리는 거미인 양 가만히 있다. 가끔 왝왝 소리를 질러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각 연의 첫 행이 아주 재미있다. "왜가리는 현장에서 시위하는 꾼이다"와 "왜가리는 회색 옷의 고집 센 스님이다"는 왜가리의 생태적 특성을 말해주고 있지만 "가는 일도 머무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다"는 시행은 말의 유희에 머물지 않고 철학적인 고찰과 존재론적인 성찰로 나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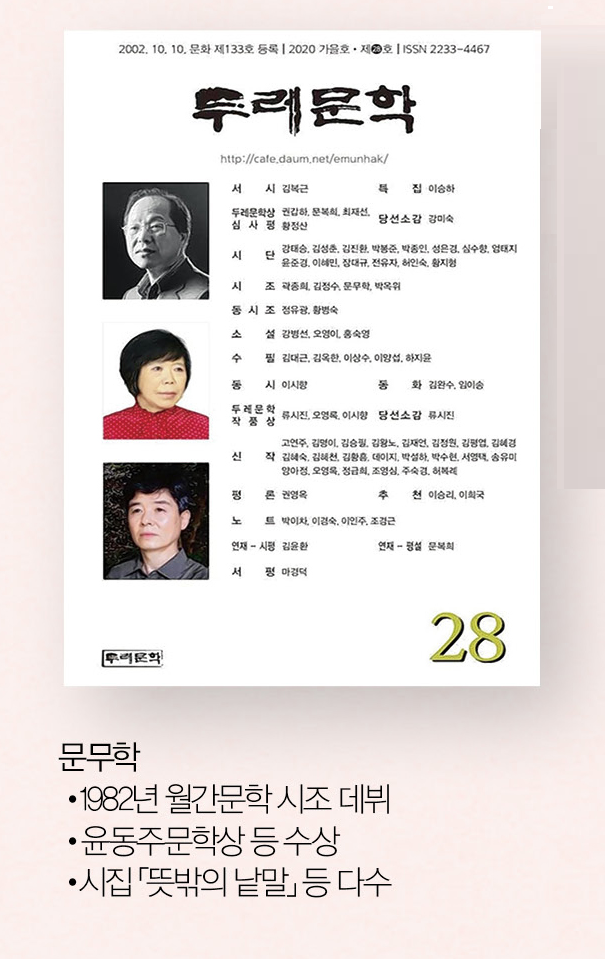
![[사진 | 두레문학 편집부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thescoop1/20240401082326581mbgm.png)
"왜? 가리"라는 말이 원효와 의상의 고사로 이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원효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법상종의 시조가 됐고 의상은 갔기 때문에 화엄종의 문을 열었다. 스님이라고 하지 말고 원효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수행 중인 스님은 한 사찰에 오래 머물지 않고 산천경개를 보면서 탁발에 나서는데 왜가리는 그런 스님을 보면서 묻는다. 왜 가리?
왜 가리? 꼭 가야만 득도하는 것은 아닐 텐데. 나처럼 여기 머물면서도 법상종의 문을 열고 수많은 책을 쓸 수 있지 않은가. 우리네 삶이란 것도 갈 수 없어 머물고, 머물 수 없어 갈 테지만 말이야.
이승하 시인
shpoem@naver.com
이민우 더스쿠프 기자
lmw@thescoop.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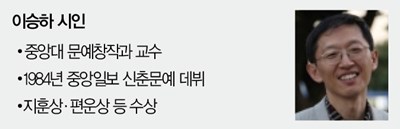
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